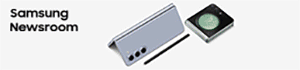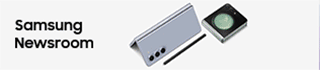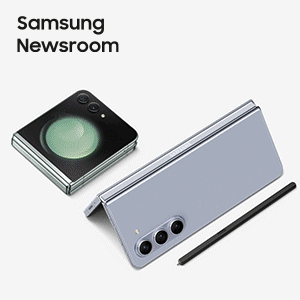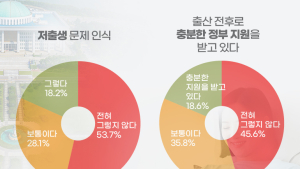아직도 깊은 바다 속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30여명이 가라앉아 있다. 아이들을 찾지 못해 넋을 놓고 전남 진도체육관에 남아있는 부모의 눈물은 이미 말랐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다.
희생자 가족뿐이랴. 지난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의 정부합동분향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이들은 130만명을 넘어섰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꼬마부터 중간고사 끝나고 달려온 청소년, 연휴의 첫 번째 계획으로 분향소를 찾은 직장인까지 모두 한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듯하다.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 리더십도 침몰했다. 우리 사회의 맨얼굴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인 이번 사고 앞에서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차곡차곡 놓여진 흰 국화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긴 줄을 기다리는 추모객의 얼굴에도 많은 생각이 스쳤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고, 알면 알수록 분통 터지고, 아이들에게 하염없이 미안하기만한, 황망한 사건이다.
우리는 새삼 알았다. 좋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안전한 나라라는 것. 추모객들은 묻는다. 이게 과연 국가인가, 정부인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국가. 그런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참에 아예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까지 나온다.
억울하고 분하다. 살아남은 자, 돌아오지 못한 자, 기다리는 자 모두 깊은 절망 속에 빠졌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과 분노 속에서 허우적댈 수만은 없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나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팽배했다. 별 노력을 하지 않고도 ‘다 잘 되겠지’하는 막연한 낙관, 나 하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설마 큰일 나겠냐는 안일함이 있었다. 그래서 선장은 배를 버리고 제일 먼저 탈출했고, 구조하러온 해경은 적극적으로 선실까지 들어가 밖으로 빠져나오라는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선사는 안전교육을 게을리 했다.
이런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성의 있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 사회와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예전엔 미처 몰랐다. 아이들의 깔깔거림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줄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이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웃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을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아이들이 물에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능력함을 느낀 적이 없다”는 한 부모의 목소리가 귓전에 생생하다.
라틴어에서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계속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가슴 아픈 이들의 손을 꼭 잡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