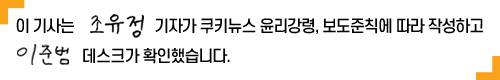조모(23)씨는 신중하게 벽지를 골랐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한 셀프사진관에서 만난 조씨는 “보통 옷과 잘 어울리는 배경을 고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밝은 벽지는 오래되면 색이 바랜 경우가 있어 피하는 편”이라고 했다. 좁은 부스 안에 연분홍색, 초록색, 회색 벽지가 보였다. 셀프사진관 브랜드에 따라 사진 느낌도 다르지만, 벽지 색도 다르다. 좋아하는 색이 없는지 벽지를 확인한 후 다른 사진관에 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아이보리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조씨가 선택한 벽지는 연분홍색이었다.
벽에 붙은 사진 수백장
24일 오전 10시 서울 동교동 한 셀프사진관에 들어서자 31㎡(9평) 남짓한 공간이 나타났다. 한쪽 벽엔 그동안 방문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 수백장이 붙어있었다. 오른쪽엔 머리띠와 캐릭터 인형 모자가 정리된 채 놓여있었다. 세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자 왼쪽에 조명이 달린 거울 3개가 눈에 띄었다. 이용객들은 이곳에서 사진 촬영을 기다리며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확인한다. 화장을 고치거나 립스틱을 바르는 이들도 있었다. 세 개의 사진 촬영 부스 중 두 개는 주로 1~2명이 이용하는 작은 부스였다. 성인 여성이 양팔을 벌리지도 못할 정도로 좁았다. 큰 부스는 6명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넉넉한 크기였다.
네컷사진이 인기를 끌며 청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엔 셀프사진관이 여러 개 들어섰다. 서울 연남동 600m 정도 되는 골목에 들어선 셀프사진관만 14개였다. 30~40m마다 셀프사진관이 들어선 것이다. 평일 저녁과 주말이 되면 네컷사진을 찍으러 온 10~20대들이 셀프사진관으로 들어간다. 매출도 급증했다. KB국민카드가 2019년부터 4년간 자사 회원의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인 사진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전년 대비 271% 늘어났다.

“네컷사진, 그냥 찍어요”
청년들에게 네컷사진은 일상이자 하나의 문화다. 100장여의 네컷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전비치(24)씨는 “셀프사진관이 보이면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 이젠 약속이 있을 때마다 찍는 수준이다. 그는 “아기 때 찍은 성장앨범을 보듯이 지금까지 찍은 네컷사진을 보면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했다. 김선애(29)씨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네컷사진을 찍는다”며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념으로 꼭 찍는다”고 했다. 친구들을 만나면 큰 고민 없이 찍는 건 권해민(28)씨도 마찬가지였다. 권씨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냥 찍다 보니,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찍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컷사진을 찍는 이유도 조금씩 달라졌다. 2016~2017년에 등장한 네컷사진은 과거 존재하던 스티커사진을 대체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네컷사진을 찍고 있는 김선애(29)씨는 “중·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스티커사진이 사라져서 추억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2016년 겨울 유행한 흑백 네컷사진이 예뻐 보여서 찍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유행 때문에 찍었다면, 지금은 기록용으로 찍는다”고 전했다.
이다혜(25)씨가 네컷사진을 처음 찍은 건 2019년 8월쯤이다. 남자친구와 기념일 데이트를 하다가 추억을 남기려고 찍은 것이 그때다. 이씨는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들이 많아져서 점점 스스럼없이 찍게 됐다”며 “새로 친해진 사람들과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앨범에 넣거나, 벽에 붙이거나”
수년간 찍은 네컷사진만 수십 장이다. 네컷사진을 찍어본 20대 10명에게 물어본 결과, 적게는 30장에서 많게는 100장까지 소장하고 있었다. 김선애(29)씨는 2016년 겨울 처음 네컷사진을 찍은 후 지금까지 찍은 약 60장의 사진을 보관 중이다. 김씨는 “잘 나온 사진이나 맘에 드는 사진은 자취방 벽에 붙인 네트망에 장식한다”며 “현재 네트망에 장식한 사진은 10장 정도다. 남은 사진은 상자에 넣어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처럼 네컷사진을 찍는 청년들은 앨범이나 추억 상자에 보관하거나 냉장고나 벽에 붙여 인테리어로 활용한다. 이모(26)씨는 “처음에는 네컷사진을 벽에 붙이거나 걸어놨다”라며 “사진이 늘어나면서 최근 사진만 벽에 걸어두고, 나머지는 서랍장 한 칸에 모아뒀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애물단지로 보이기도 하지만, 버리기는 아깝다”며 “다시 들여다보는 맛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기록하기 위해 네컷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다혜(25)씨는 편지를 보관하는 종이봉투에 사진을 모아둔다. 이씨는 “아무래도 저와 지인들 얼굴이 있어 버리기는 좀 그렇다”라며 “같이 보낸 즐거운 시간을 떠올릴 수 있어서 가끔 꺼내서 구경한다”고 털어놨다.

반짝인기 넘어 이젠 문화
셀프사진관이 과거 인형 뽑기처럼 반짝인기를 누린 후 줄폐업할 거란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인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셀프사진관 브랜드는 50여개에 달하고, 전국 매장 개수는 1000개를 넘어섰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홍대와 성수에는 각 30개가 넘는 셀프사진관이 영업 중이다.
이수진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은 네컷사진이 이제 하나의 아이템보다 문화적 요소로 기능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단순히 사회적 창업 아이템으로 끝나면 단편적인 유행으로 끝나기 쉽다”며 “세대 특성 때문에 네컷사진이 문화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관광지나 결혼식에서도 네컷사진을 찍는 것이 그 예시”라고 설명했다.
네컷사진의 인기에는 세대적 특성이 존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친구들과 기록, 사진을 찍기 위해 나를 꾸미고 표현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Z세대와 알파세대 특성에 잘 맞는 것”이라며 “사회적 맥락으로 봐도 저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어서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