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은 사라졌을까 [기자수첩]](/data/kuk/image/2024/04/30/kuk202404300345.568x.0.jpg)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은 급증하는 패스트패션을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기업 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패스트패션 제품당 5유로(한화 약 7000원)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저가 의류 판매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내가 ‘철 지난 옷’을 입어 ‘유행에 뒤떨어졌다’는 감각은 소비만능시대에 잠식된 현대인의 손톱을 물어뜯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패스트패션은 친절하고 부지런히 새 옷을 선보인다. 자라, H&M, 유니클로 등 스파(SPA) 의류 브랜드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 일 년에 52개의 마이크로 컬렉션을 선보이며 지갑을 열게 만든다.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많은 옷을 생산해 내는 패스트패션은 필연적으로 방대한 양의 의류 쓰레기를 남긴다. 최근 유행하는 ‘고프코어’룩의 주된 원료인 나일론, 손 닿는 모든 옷에 섞인 폴리에스터 등 썩지 않는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은 땅에 묻힌다. 1년간 발생하는 의류 쓰레기는 약 4800만톤이다. 1초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버려진다.
환경 파괴 뿐만이 아니다. 패스트패션은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을 담보로 만들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은 노동절이다. 봉제 공장에서 일주일에 100시간 일을 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불에 타 죽은 전태일이 떠오른다. 봉제업은 1차 산업에 강한 개발도상국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1965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임금과 노동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엔 어린 미성년자 봉제공이 많았다. 이후 한국이 ‘살만 한 나라’가 되자,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섰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이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들도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영국인 남성은 베트남 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6.9%나 올라 걱정이 된다고 했다. 베트남의 인건비와 물가가 올라 고된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적게 줄 수 있는 건 다 옛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오른 베트남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 기준 710만동(한화 약 38만원)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한다. 많은 패션 기업이 에티오피아 공장으로 눈을 돌렸다. H&M은 이미 수년 전 에티오피아 현지 생산 업체에서 의류를 생산한다. 에티오피아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4~5만원 수준이다.
패스트패션은 그렇게 바다 건너,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전태일을 찾아 나선다. 더 진득한 착취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눈을 돌린다. 입으면 입을수록 착취의 굴레는 빠르게 돈다. 가장 가난한 나라마저 공임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을 때, 터무니없는 싼 값으론 아무도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때. 패스트패션은 종말을 맞는다.
사실 패션 산업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대안을 제시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있다. 최대한 환경에 덜 유해한 옷을 만들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의류 종사자의 적법한 대우를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다. 소비자로서 기업이 사회적 영향력을 재고하도록 압박하는 단체와 개인들도 있다.
의류 산업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빠르게, 싸게, 많이 만들어 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패스트패션엔 미래가 없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내가 입고 있는 한 철 짜리 옷은 누군가가 뼈와 살을 깎아 대가를 치른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 내 소비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더 고민하고 서랍장 속 옷들이 바뀌는 속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비건·지속가능성 등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소비와도 맞물린다.
1세계의 세련된 ‘패션’을 위해 3세계 저임금 노동자의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일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더,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한 달 80만원에서 30만원, 3만원까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지나 이제는 에티오피아에 닿았다. 이 다음은 어딜까. 십 년 후엔 누가 내 옷을 만들고 있을까.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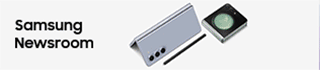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김일수 부교육감, 소년체전 참가선수 건강·식중독 등 주의 당부 [충남에듀있슈]](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20/kuk202405200128.275x150.0.jpg)



![[속보] 로이터 “이란 당국자, 라이시 대통령·외무장관 사망 확인”](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75x150.0.jpg)
![DGB금융, ‘세대를 잇는’ 상생 기부금 전달 외 [금융소식]](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20/kuk202405200121.275x15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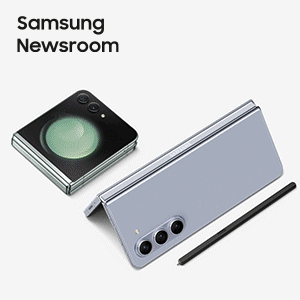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선제적 관리 필요한 젊은 만성질환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5/kuk20240515010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