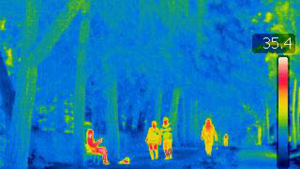호주 빅토리아 주 출신 메리 켈리(1880~1964)가 부산 도착 이듬해 남긴 부산의 풍경. 서구 우월적 시선이 담겼긴 하나 개항도시 부산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가 그려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 7번 출구 앞 일신기독병원에서 산 쪽으로 본 풍경의 묘사다. 이 여성이 훗날 ‘부산 근대의료사의 어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난 20일 좌천역 7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일신기독병원 신관이 위용을 자랑한다. 한 블록 뒤에 있던 본관은 이제 구관이 됐다. 일신기독병원은 1900년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주축 ‘기독병원’ 중 하나다. 전주예수병원 등과 함께 ‘살아남은 기독병원’으로 꼽힌다.

메리가 그려냈던 부산 좌천동. 메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위투성의 언덕’을 오르내렸다. ‘저런 초라한 오두막에 사람이 살까’라고 했던 언덕의 집집마다 바다를 향한 통 창을 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유난히 눈길을 끈다. 급경사 집들인데도 80대 이상 노인들도 불편함이 없다.
병원 뒤로 증산공원(옛 부산진성)까지 700m 남짓한 골목마다 개항기 민족자존을 높인 인물들의 스토리보드를 담벼락에 조성해 놓았다. 의료·보건·주거 복지에 새삼 놀라는 대한민국이다.

이 좌천동은 지금은 부산의 구도심이지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었다. 일신기독병원을 중심으로 300m 반경의 공간은 ‘살아 있는 인술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히포크라테스·나이팅게일 선서의 의료윤리와 원칙이 실천됐던 공간.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부산 첨사 정발을 기리기 위한 정공단과 왜성 그리고 근대 병원, 학교, 교회 등이 한 눈에 들어오는 독특한 역사공간이다.
그런데 이 공간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교 편향’이라는 ‘지나친’ 기준에 얽매인 나머지 봉인적 공간으로 만든 점이 아쉽다. 이곳에서 위대한 의료선각자들이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철저히 지킨 현장인데도 말이다.
‘호주 매씨’. 본관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 성은 매(梅) 이름은 견시(見施). 원명 제임스 맥켄지. 직업 의사. 조선의 호주 매씨 시조를 자처했던 매견시(1865~1956)는 1910년 조선 부산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후 제일 먼저 부산의 한센병 환자(나환자)를 거두었다. 그들의 치료·격리·자활의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의 한국에서의 첫 출발은 부산진, 지금의 일신기독병원 뒤편 부산진교회 자리에서였다. 매견시는 호주장로회 소속 의료선교 의사였다. 그가 입국할 당시 미국북장로회가 조선의 평양 선천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 선교병원을 두었는데 부산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1890년대 부산 영선현(현 코모도호텔 인근)에 구제소가 운영됐으나 서구 기독교파 간 조선에 대한 경남(부산)지역 선교영역 논란 등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한 상태였다.
매견시 내한하던 해 조선은 패망했다. 극도의 정치적 불안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유랑걸식하는 백성이 늘었다. 그러니 천형이라 일컫는 ‘문둥병’(정식 명칭 한센병) 환자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떠돌았다. 그럼에도 부산에 먼저 들어와 있던 미국 출신 의사 어빈 1904년 등이 ‘나병선교회’ 등을 조직, 환자들에게 ‘현대 의술’의 적용이 필요함을 본국에 역설했다.
당시 따뜻한 경상·호남 지방에는 나환자들로 넘쳐났고 특히 인구 등이 밀집하여 걸식에 용이했던 부산과 같은 큰 도시에 주로 몰렸다. ‘경상도 보리문딩이’ 어원이기도 하다.

나환자에겐 배척과 혐오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그들을 맥켄지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를 떠나 사랑으로 안았다. 1939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그는 오직 나환자를 위해서만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나환자들의 친구’ 또는 ‘성자’로 불렀다.
‘난 두 명의 남성과 한 여성 나환자의 수용을 거절해야 했다.…수용 인원보다 더 많이 수용된 탓에 그들을 수용해주지 못했다. 그것이 종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현재 편안한 내 침대로 들어가 자려는 순간에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기온은 영하였다.’(맥켄지 기록 중)
그가 초기 나환자요양원을 열었을 때 1명이 죽으면 40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각 방에는 제한된 인원수보다 3배나 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었다. ‘기이한 도시’였다.
그런데 ‘기이한 도시’라고 말한 메리가 맥켄지와 결혼했다. 그리고 부부의 두 딸은 각기 의사와 간호사로 6·25전쟁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일신기독병원에서 한국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다. 비혼이었던 자매는 정년 후 빈손으로 부모의 나라 호주 돌아가 양로원에서 생을 마쳤다.(계속)
[의사 맥켄지 특별한 결혼]

1905년 두 명의 서양 여성이 선비로 보이는 근엄한 조선인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진이다. 오른쪽이 미스 메리 켈리이고 왼쪽이 그의 친구 니븐이다. 두 사람은 그해 호주장로회 여선교회연합회 소속으로 조선에 파송되어 주로 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교사로 활동했다. 경남도(부산 포함) 내 5개 학교 순회 교사였다.
1910년 맥켄지가 부임해 진주 지방을 방문했다. 그는 메리에게 반해 청혼을 했다. 사실 맥켄지는 1908년 호주 북동쪽 바누아투에서 인술을 펼치다 흑수병으로 첫 아내 메기를 잃었다. 자산도 그 병으로 수개월 고생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시드니를 거쳐 부산으로 왔었다.
메리는 결혼 후 나환자 자녀를 위한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 운영을 맡아 그들과 부산의 고아들을 위해 헌신했다.
전정희 편집위원 laka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