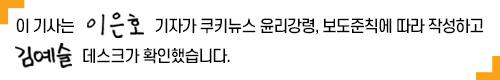지난 14일 개봉한 영화 ‘킬링 로맨스’(감독 이원석)의 주인공 황여래(이하늬)는 음료수 1.2ℓ를 4.3초에 마셔 단숨에 스타가 됐다. 그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웃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연기했다. 조롱과 환호에 지쳐 눈시울을 붉힐라치면, 어디선가 손수건이 나타나 눈물 자국을 말끔히 지워냈다. ‘여래이즘’이란 찬사 속에서 여래는 시들어 가고 있었다.
영화 개봉 후 서울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이하늬는 “숨구멍 없이 감정노동을 해야 했던 여래의 감정을 나도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06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뒤 2009년 KBS2 ‘파트너’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한때 카메라 감독님에게 ‘넌 미스코리아도 나왔으니 (연기하지 말고) 시집 가’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으로 한국영화 최고 흥행 2위 기록을 가진 1000만 배우의 시작은 의외로 화려하지 않았다. 한동안 ‘여자 2번’(두 번째 여자 주인공)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스태프로부터 ‘미스 유니버스 출신이 이래서 어떡하냐’는 걱정 아닌 걱정을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하늬는 “내겐 사람들이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보다, 어떤 배우로 성장하겠다는 주관적 지표가 더 중요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킬링 로맨스’의 여래도 이하늬가 가진 불굴의 습성을 빼다 박았다. 연예계를 떠나 콸라 섬으로, 남편 곁을 떠나 자유로 향했다. 코미디 연기에는 도가 튼 이하늬에게도 여래는 색다른 캐릭터였다. 그는 “코미디를 하는 캐릭터는 양기를 뿜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여래는 감정 기복이 크고 감정의 층위도 여러 겹이었다”고 돌아봤다. 여래가 남편에게 학대당한 뒤 ‘제발’을 부르는 장면이 특히 그랬다. 이하늬는 “지하 100층까지 내려가는 감정”으로 노래를 불렀다. 촬영 당시 오디오에 소음이 섞여 후시녹음을 따로 했다가, 달파란 음악감독 등이 소음 하나하나를 걷어내 라이브 버전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작품이 워낙 별나 배우들끼리 ‘영화 개봉하면 이민 가자’는 농담을 주고받았다지만, 사실 이하늬는 “‘킬링 로맨스’를 위해선 뭐든 해낼 각오가 돼 있었다”고 했다. “색깔 있는 영화가 한국 영화계를 지탱한 토대”라고 생각해서다. “‘킬링 로맨스’는 역사에 남을 영화”라는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되고 있다. 작품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덕분이다. 개봉 당일 61%를 기록한 CGV 골든에그지수(관객 평점)는 24일 75%까지 올랐다.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평점 역주행이 이어지길 기원하며 최근 ‘킬링 로맨스’ 무대인사에서 관객 일부에게 맥반석 계란을 선물하기도 했다.

“돌아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촬영했어요. 매일 어떤 산을 넘은 기분이랄까요. 다행히 배우들끼리 호흡이 무척 좋았어요. 재회한 배우들의 호흡이란 게 무서울 정도더군요(이하늬는 MBC ‘파스타’에서 이선균, 영화 ‘극한직업’에서 공명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유랑극단처럼 지방을 돌며 촬영하다 보니, 서로 에너지와 흥을 주고받으며 캐릭터 구축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도 비주얼부터 연기 톤, 음악까지 다양한 참고자료를 준비해주셨어요. 레슬링 선수, 록스타, 뮤직비디오…. ‘어디서 이런 걸 찾았지?’ 싶을 정도였어요.”
화려한 외모로 미스 유니버스 무대를 주름잡던 미녀 스타는 삶에 이끼를 끼우며 배우로 다시 태어났다. 조선총독부에서 첩보원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영화 ‘유령’)를 지나, 남편을 죽이려는 전직 톱스타(‘킬링 로맨스’)를 거친 그는 올해 방영되는 MBC ‘밤에 피는 꽃’으로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밤이 되면 담을 넘는 15년차 수절 과부 역할이다. 이하늬는 “최근 5년간 여성 캐릭터가 다양해졌다고 느낀다. 과거엔 캔디 아니면 악역이었는데, 요즘엔 주체적으로 성취하는 여성 캐릭터가 많아져 기쁘다”고 말했다.
“‘넌 못해’ ‘넌 안 돼’ ‘넌 여기까지야’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어지는 역할도 카메라로 몸을 훑는 캐릭터가 대부분이었고요. 내가 가진 게 그거(외모)뿐인가 자괴감이 컸어요. 그때 기적처럼 제게 ‘넌 배우야’라고 말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영화 ‘타짜-신의 손’의 강형철 감독님이 그랬고, 영화 ‘침묵’의 정지우 감독님이 그랬죠. 그런 은인들 덕분에 자유와 신뢰를 배웠습니다. 드라마, 영화, 판소리, 뮤지컬… 어떤 경험이든 버릴 게 없더라고요. 차곡차곡 제 안에 씨앗처럼 채워놓고 있어요.”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