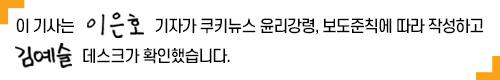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내가 납치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배우 정우성의 장편 감독 데뷔작 ‘보호자’는 기본 골격이 영화 ‘아저씨’(감독 이정범)와 비슷하다. 하지만 ‘보호자’는 ‘아저씨’와 다른 길을 간다. 뜨겁기보단 건조하고, 잔혹한 묘사도 덜었다. 문제는 쾌감과 재미도 함께 반감됐다는 것이다.
주인공 수혁(정우성)은 한때 조직폭력배에 몸담았다. 큰 형님으로 모시던 자를 칼로 찌르고 교도소에 갇힌 세월이 10년. 그 사이 수혁의 연인 민서(이엘리야)는 딸 인비(류지안)를 몰래 낳아 기른다. 출소 후 수혁은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하며 평범한 아빠가 되기로 다짐한다. 조직은 이런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성준(김준한)은 킬러 2인방에게 수혁을 해치우라 지시한다. 두 사람은 수혁을 유인하려 인비를 납치한다.
영화는 서사나 개연성엔 관심이 없다. 수혁이 왜 큰 형님을 배신했는지, 성준은 왜 수혁에게 열등감을 느끼는지, ‘세탁기’로 불리는 우진(김남길)과 진아(박유나)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고독한 싸움꾼 수혁과 수혁을 견제하는 성준, 악랄한 조직 보스 응국(박성웅)과 시한부를 선고받은 민서 등 주요 인물 설정과 관계가 어디서 본 듯 익숙하다. 작품은 이런 클리셰를 비트는 대신 뻔뻔하게 받아들인다.

이야기의 결함을 채우는 것이 장르적 재미의 몫. 그러나 ‘보호자’의 액션은 영 시원치 않다. 우선 뜸을 너무 오래 들인다. 중반부 이후 육탄전과 자동차 추격전을 오가고 못을 발사하는 총과 수제 폭탄까지 쏟아내지만, 속도감과 긴장감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인상적인 장면이 없지 않으나 액션 시퀀스 대부분이 그 장면을 만드는 데 복무한다는 인상이 강하다. 정우성과 김남길 두 ‘액션 고수’의 역량을 생각하면 더욱 아쉽다.
살육 자체를 볼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액션 영화’를 고민한 흔적은 역력하다. 정우성은 최근 열린 언론·배급 시사회에서 “영화인으로서 폭력을 대하는 방식이 정당한가 고민했다”며 “폭력의 세계를 떠나려는 수혁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폭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다. 수혁의 입장에서 상황을 디자인하니 자연스럽게 개성 있는 연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백미는 결말이다. 생사 갈림길에 선 인물들이 수혁을 향해 한마디씩 던진다. 분위기는 비장한데 객석에선 키득대는 소리가 들린다. 혹시 극단적으로 과장된 캐릭터와 과잉된 엄숙함으로 느와르 영화 자체를 풍자하려는 감독의 의도일까. 안타깝게도 허술한 마무리가 호기심을 키우기 전에 헛웃음부터 나게 한다. 15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