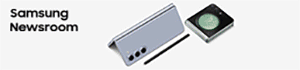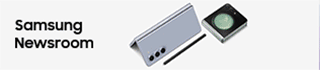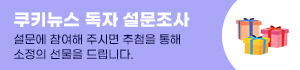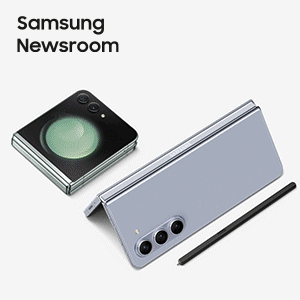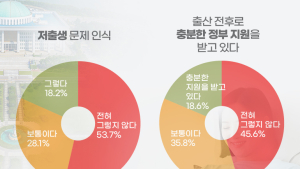19일 경북 김천의 한 빌라에서 만난 영희(13·가명)는 티없이 맑은 표정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 지독한 집단 따돌림에 시달렸던 영희, 너무 힘들어서 음독까지 생각하며 책가방에 아세톤을 넣고 다녔던 영희가 아니었다. 강동원이나 휘성 같은 연예인을 좋아한다는 영희의 모습에서 과거의 우울한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영희는 이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실도 털어놓았다. 하지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해서 괜찮아요”라고 말할 만큼 어른스런 모습을 보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영희의 상태는 심각했다. 한 학년 당 13∼14명에 불과했던 작은 시골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영희에게 말동무가 돼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영희를 상대로 ‘넌 헌옷만 입고 다니냐’며 놀렸다. 운동화에 죽은 사마귀를 넣어놓기도 했다. 친구가 벌을 서는 모습을 보고 영희가 웃었다는 것이 왕따를 당하게 된 이유였다. 아세톤을 지니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하지만 그 해 9월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에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남기면서 영희는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김진성(32·여) 전문상담가는 영희의 글을 읽고 이후 40차례가 넘게 영희와 전화를 주고 받으며, 때로는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말벗이 돼주었다.
“네가 잘못한 것은 없어. 절대 기죽거나 우울해하지마”라고 격려해줬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영희가 단편소설을 적어서 보내주면 품평도 해주었다. “영희는 좋은 소설가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영희는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힘이 됐던 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영희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해’라는 말이요”라며
활짝 웃었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영희의 꿈은 상담원이 되는 것이다.
“김진성 선생님처럼 훌륭한 상담원이 되고 싶어요. 과거의 저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돼주고 싶거든요.“
한때 따돌림을 당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도 많이 생겼다는 영희의 얼굴은 지난 몇 주 동안 아이들과 뛰노느라 검게 그을려 있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 서부교육청 위센터에서 만난 유나(14·가명)는 좀처럼 말문을 열지 않았다. 유나는 “예전의 내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다”는 말만 반복했다.
유나는 동갑내기 친구 소희(가명)에게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 메시지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1년 넘게 15만원이 넘는 돈을 뜯었다.
견디다 못한 소희가 담임선생님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유나의 비행(非行)은 탄로나 위센터로 오게 됐다.
“처음 유나를 만났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유나 부모님도 ‘왜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벌을 주냐’면서 상담을 일종의 처벌로 생각했어요.”
김순임(50·여) 사회복지사는 유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다양한 심리치료기법을 동원했다. 김 복지사는 상담을 시작한지 3일만에 유나 앞에 하얀 도화지 한 장을 내밀었다.
“소희를 생각하고 아무 그림이나 그려봐”.
말수가 적은 유나의 심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미술치료였다. 유나는 주사기와 알약, 반창고를 그려 넣었다. 상처 입은 소희의 마음을 고쳐주고 싶다는 표시였다. 유나가 인터뷰 내내 말이 없었던 이유도 이 같은 죄책감의 표시였던 셈이다. 지난 3달 동안 19차례가 넘는 상담을 하며 유나와 소희는 다시 예정의 ‘절친’으로 돌아갔다.
김 복지사는 “유나가 과거의 실수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는데도 일주일에 1∼2번씩 위센터를 찾아온다. 다음에 만나면 옷을 사주겠다고 말했는데 무슨 옷을 사야할 지 모르겠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김천·인천=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