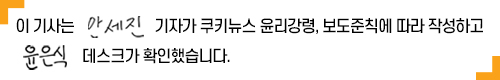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스마트 농부’로 변신 중이다. 최근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 먹거리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마트팜 시장이 커지면서 그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17년 4조4493억원에서 연평균 5% 성장해 올해 5조95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적용해 농수축산물 생육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농장이다.
스마트팜 규모가 이처럼 커지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상기후와 물 부족, 농축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라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먹거리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저마다 애그테크(정보기술을 활용한 농업) 기업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채소나 계란 등을 출시 중이다.
이마트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스마트팜 기업 ‘엔씽’에 지분을 투자 중이다. 이마트는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경기도 이천 이마트 후레쉬센터 옆에 직접 스마트팜을 세우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선보인 ‘뿌리가 살아있는 채소’ 시리즈는 지난해에만 8만개 이상 팔렸다. 판매량이 높았던 시기를 분석한 결과 7~8월(장마와 폭염), 9월(태풍), 12월(한파) 등 기후위기 때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엔씽을 포함해 3곳의 스마트팜 업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늘(14일)부터 1주일간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된 채소를 이마트 전점에서 행사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후에는 30~40개 점포로 축소 운영을 한 뒤 단계적으로 전점 운영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팜이 생산량이나 재배속도와 관련해선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이같은 장점은 장마기간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평상 기후 때는 일반 밭에서 재배한 작물들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후가 좋지 못할 때 치솟는 일반 작물 가격과는 달리 스마트팜 작물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역시 스마트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스마트팜 기업인 ‘팜에이트’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팜 채소 6종(버터헤드레터스 등)을 판매 중이다. 현재 취급 점포는 리뉴얼된 7개점이지만 향후 전국 61개 점포로 확대해 판매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스마트팜 도입 후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또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채소 상품 45종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이들의 누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 이상 늘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스마트팜 메뉴는 전국에 메가푸드마켓 7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팜 이용한 샐러드는 전국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향후 샐러드뿐만 아니라 일반 스마트팜 채소들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마트팜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수산물 식재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전통시장이나 지역 내 위치한 식자재마트 등 농가와 협업관계에 있는 시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기후위기에 따라 스마트팜 시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금처럼 스마트팜 시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농가의 기술과 공급을 잘 관리할수록 있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