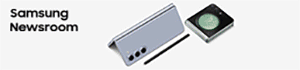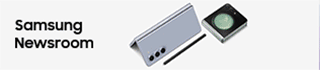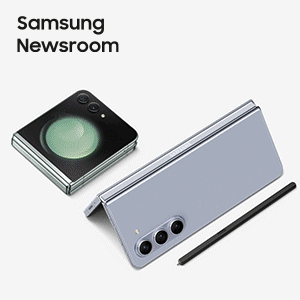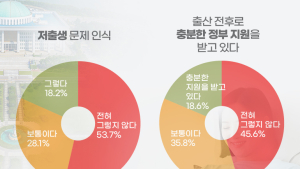정부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줄이겠다며 수천억원을 들여 권역외상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중증 외상치료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란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적절한 치료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간단한 조건이지만 현재 국내 중증외상의료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송시간 짧아졌지만 지켜지지 않는 골든타임=사고 발생시 손상의 중증도를 파악해 최선의 병원으로 이송돼야하지만 실제 외상환자는 외상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하다 뒤늦게 치료다운 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 김영철 교수는 “골든타임의 정확한 표현은 골든아워(Golden hour)다. 이는 사고현장부터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난 후 한 시간 내로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중증 외상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구색만 갖춘 응급실에 던져지고 애꿎은 CT촬영 등 각종 검사로 시간을 허비한다”며 “일반 응급환자와 상태가 심각한 중증외상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은 ‘환자 이송’이 아니라 ‘환자 배달’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해준 연구결과가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구영 연구팀이 2011년 복지부에 제출한 ‘우리나라 외상의료체계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현저히 빨라져, 이송체계의 시간적 요인은 호전됐으나 응급실의 치료의 질은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 도착 후 수술까지의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나와 있다.
◇‘외상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겉모습에 치중=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치우친 현 정책도 문제였다. 외상치료 발전에 사용될 예산의 상당 부분이 환자 이송을 위한 헬리콥터 구매에 들어간다. 그러나 외상 전문의들은 “구급헬기가 필요한 이송사례는 극히 적다”며 “실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건물만 들어설 것이 아니라 의료장비나 전문인력, 구급대원과 연계된 통신시스템 등이 소프트웨어가 보충돼야하는데 채워 넣어야할 것은 채우지 않고 겉모습에만 치중한다. 몇 개의 권역응급센터가 들어섰는지 보다 한 곳의 권역응급센터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즉, 예산이 건물을 짓고 헬기를 사들이는 곳으로 흘러가 병원 치료의 질은 나아지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외상전문의 양성 전무…대부분 해외서 연수=외상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도 몇 곳 없다. 그나마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맡아 유명세를 떨친 아주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정도다. 외상외과 전문의를 양성하거나 교육하는 수련병원(대형병원)이 없다. 외상 전문 외과의사로 알려진 의료진들은 대게 미국 대학병원 외상외과에서 연수를 받은 경우다. 김영철 외상외과 교수는 “칼에 찔렸을 때 어떤 외상처치가 들어가야 하는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뭉개졌을 때 어떤 치료를 시행하는지 응급의학만으로는 부족하다. 외상외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교육의 부재는 고스란히 외상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구급차에 실려와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송을 위해 구급용 헬리콥터를 운용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를 위해 응급의료 인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