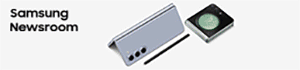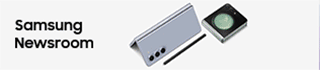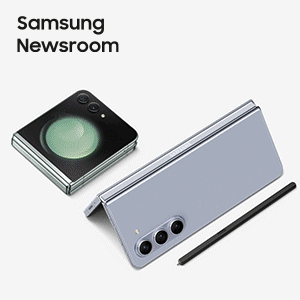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여의도 한복판의 한 음식점. 기자 둘과 금융권 관계자 한 명이 마주했다. 교류 차원에서 가볍게 만난 자리. 그런데 대화가 쉽지 않았다. 금융권 고위직에서 오래 근무한 그는 아주 유능한 '맥커터(脈 cutter, 대화의 맥을 잘 끊는 사람)'였다. 어느 대화 소재도 그와 길게 나눌 수 없었다.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여의도 한복판의 한 음식점. 기자 둘과 금융권 관계자 한 명이 마주했다. 교류 차원에서 가볍게 만난 자리. 그런데 대화가 쉽지 않았다. 금융권 고위직에서 오래 근무한 그는 아주 유능한 '맥커터(脈 cutter, 대화의 맥을 잘 끊는 사람)'였다. 어느 대화 소재도 그와 길게 나눌 수 없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렷다. 분위기는 금세 경색됐다. 동석한 일행의 입가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고,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대화 소재가 바닥 쳤을 즈음, 깨달음이 왔다. 이 사람은 강적이다. 오늘 자리 쉽지 않겠구나. 애써 말을 이었다.
"음식은 괜찮으세요? 여기 저번에 A사 대표님과 한번 같이 와봤던 곳인데 괜찮아서 눈여겨 봐뒀거든요. 여기 주방장님이 해외에서…"
무심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꺼낸 말. 그때였다. 딱딱하게만 굳어있던 그의 입매에 환하게 웃음이 번진 것은. 마주한 지 1시간이 다 되어서야 본 미소였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반색을 한 그가 밝은 목소리로 되물어왔다.
"A 대표님을 아세요?"
누가 알았으랴. 그 자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A가 경직된 그 날의 분위기를 풀어줄 열쇠였음을. 말문을 튼 그는 계속해서 A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와 A의 인연, 친분, 학벌, 증권사부터 다양한 금융권 기관까지 과거 A가 역임해온 직함들. A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없었으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소재였기 때문이다. 그날의 저녁 식사 마무리는 "조만간 A 대표와 같이 한번 더 보자"로 마무리됐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그 자리에 동석했던 또 다른 인물인 B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셋이 만났던 자리. 대화의 주 흐름이 관계없는 타인을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그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금융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처럼 학연·지연으로 점철된 대화를 흔히 나누게 된다. 일종의 단골 대화 양식이다. 공통의 지인, 그 관계에 대하여. 그 지인의 신분이 수평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보다, 관련 분야의 '고위직' 일수록 대화는 더 잘 이어진다. 의도적으로 이런 대화를 선호하는 이들은 꽤 많다. 선호의 이유는 인맥 형성이 쉽고, 결속을 다지기 쉬운 대화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연과 학연을 이용한 인맥 형성이 모종의 '로비'에도 도움이 되어서일 테다.
결국 이같은 대화 양식은 금융권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확장해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즐기는 대화방식이 돈과 지위, 그에 따르는 권력이 중요한 금융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일 테다. 좋게 보면 공통점을 찾아 인맥을 늘리는 방식일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대화 양식의 근간에는 차별과 배제가 내재되어 있다. 학연과 지연의 망이 넓지 않은 이는 참여하기 쉽지 않은.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일종의 '이너서클'. 그들만의 '끈끈한 리그'를 만들기 위한, 혹은 유용한 리그에 들어가기 위한 대화방식이다.
대화도 그 사회를 이루는 문화의 하나다. 사람 간에 오가는 말속에서 그 사회의 관습과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우리는 언제쯤 개개인의 역량과 인품보다는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학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을 떨쳐낼 수 있을까. 보다 더 나은 대화를 추구할 수는 없을까. 당신은 어떤 대화를 나누며,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나.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