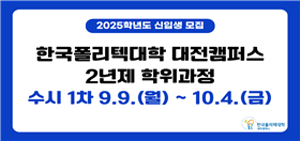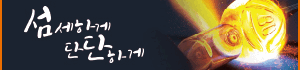처음 만난 가을이 가고 이듬해 봄을 지나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샌들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내 발을 보며 '참으로 순한 발을 가졌다'고 말했다. 난 새삼스레 내 발을 들여다보며 ‘순한 발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냥 그렇게 느꼈다고 했다.
알 수 없는 그런 발로 내가 그 시절을 떠나온 뒤, 그녀는 일주일이 7일이란 것 때문이 아니라, 소주 한 병이 일곱 잔이란 것에 착안해 일곱이란 스터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름은 그렇게 붙였으나 일주일 내내 소주가 아닌 소설에 매달려 습작과 고뇌와 그 뒤에 오는 무엇들을 독하게 삼키더니 만 시간의 법칙을 거쳐 강인한 소설가가 되었다.
뒤에 실린 또 다른 작가는 그녀가 약사였던 때 만났다. 한 강연회에서 우연히 내 옆에 앉은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내게 여러 말을 건넸다. 나는 속으로 그녀가 좀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며 건성건성 대답을 이어갔는데 헤어질 때쯤엔, 그녀의 전호번호와 익산 사시는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말기 암투병 중이란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내게 부고 문자를 보내 그날 밤 익산까지 와주겠냐는 말을 물었을 때, '순한 발'을 가졌던 나는 오 분쯤 황당해하고 오 분쯤 고민했었다. 그러나 파티도 축제도 아닌 문상이라 나는 결국 익산행 저녁 버스를 탔다.
이미 깊어진 밤, 쓸쓸한 영안실을 찾아가자 그녀는 마치 나를 기다린 듯, 나는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이었다는 듯, 나를 맞이했고 나는 그것에 놀랐다. 그리고 그녀 남편은, 대체 둘이 언제부터 아는 사이기에 이 밤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게 놀라워했다. 그날의 문상은, 그런 속에서 혼자만 지극히 자연스럽던 그녀와 그녀 남편과 함께 낯선 사람끼리 국밥을 나누어먹는 것으로 끝났다. 그녀 자체를 몰랐으니 돌아가신 그녀 어머니에 대한 애도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게 자신이 이제 고아가 되었다고 말했고, 나는 고아가 아닌 사람도 언젠가 고아가 된다는 것에 문득 섬칫했다.

새벽 첫 기차로 서울에 돌아오자 막 동이 트기 시작한 용산역엔 남편이 이상하고도 거짓말 같은 문상을 마치고 온 나를 마중 나와 있었고, 뒷골목 홍등가엔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나와 절친이 된 그녀는 처음 본 내게 말을 걸었듯, 캡슐에 약조제하듯, 낯가림도 거침도 없이 내게 글을 묻고 쓰기 시작하더니 십 년 만에 또 시인이 되어버렸다. 불 끄듯 어느새 내가 글쓰기를 멈춰버린 뒤였다.
책을 읽으려다 지나간 세월만 읽고 있는 사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겁 없이 내 발밑에 와서 졸았다. 무심한 고양이인지, 방심한 고양이인지 아니면 놈이 보기에도 내 발이 순하고 만만해 보이는지... 내가 바라보면 도망갈 만한데도 그러지 않는, 나처럼 어리석거나 순하거나 아님 게으른 길고양이를 보며 나는 다시 내 발걸음을 돌아보았다. 그야말로 꿈과 같이 서성거리던 오후, 나를 변명했다. 누가 그랬던가. ‘좋아하던 일도 그것이 업이 되면 고통스럽다’는데 난 그걸 업으로 만들어 선을 넘기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라고... 이십 년 전에 덜컥 등단은 했지만 개점과 동시에 휴업을 하여 여전히 쓰는 고통을 모르는 나를 위안했다. 순전히 억지였다.
이제 와 생각하면 순한 발은 게으른 발이었을 것이다. 발걸음을 떼긴 했으나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걸어왔으나 도달한 곳은 없는, 영광이 없으니 상처도 드러낼 수 없이 가만히 매달고만 있는 발. 그러고 보면 내 발 앞에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발이 그 길을 가지 않아 나는 십 년 이십 년 만 시간 수만 시간 그보다 더한 세월을 참 서성거리고만 살고 있다. 꿈과 같이...
차라리 꿈이었다면 후회도 변명도 필요 없고 좋았겠지만 꿈이 아닌 평생을 그렇게 지나온 뒤, 나는 가지 않은 길을 떠올리며 내 게으름에 벌을 매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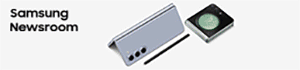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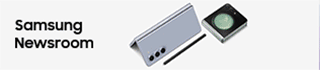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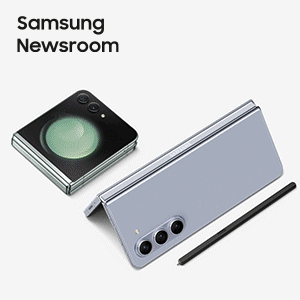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 (55)](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9/17/kuk20240917000027.300x20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