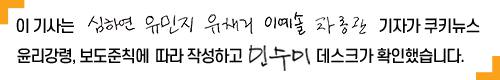사회 위계는 건물에도 있다. 돈이 이를 구분 짓는다. 지난여름, 반지하에 산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건물의 위계가 생사를 갈랐다.
정부는 반지하를 비정상거처로 규정하고, 그들을 땅 위로 올리는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상이 아닌 그곳엔 여전히 사람이 산다. 나가지 못하는 사람과 빈자리를 채운 사람. 예고된 재해 앞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세 편의 기사에 담았다. [편집자주]

“침수된 집인 거 알았지, 그래도 별수 있나. 여기 말고는….”
뜨거운 여름, 사람들은 물을 찾아 떠났지만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사람들은 물을 피해 달아나야 했다. 지난해 8월8일, 신림동 반지하는 내린 비와 흙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한 달 후 침수됐던 반지하에 사람이 들어왔다. 김성근(72)씨와 그의 가족이다.
바짝 민 머리가 적응이 안 된 듯 김씨는 맨들거리는 머리를 자주 만졌다. 그는 지난 1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의 아내 김송희(47)씨는 지난 2월 말 퇴원했다. 그는 뇌질환으로 1년 6개월을 병원에서 보냈다.
전용면적 69.83㎡(23평) 반지하에 김씨와 아내, 아들(20), 딸(19)이 살고 있다. 김씨 가족의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노령연금을 합친 90만원이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한 딸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 딸이 월급을 받자 지원금은 60만원으로 줄었다. 새로운 수입이 생겼지만 4명이 한 달을 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김씨는 이곳으로 오기 전, 서울 관악구 한 빌라 1층에서 4년 동안 살았다.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는 20만원을 냈다. 이 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들어갔다. 보증금 중 400만원만 그의 돈이었다. 그는 계약을 연장하길 원했지만 집주인은 거부했다. 오래된 빌라를 고쳐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 했다.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세 중에서도 LH 지원이 가능한 집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집을 구하기 위해 관악구 인근 부동산을 스무 곳 넘게 돌아다녔다. 가까스로 보증금 1억3500만원에 월세 20만원 집을 구했다. 전에 살던 집과 월세는 같다. 하지만 보증금은 오르고 층수는 내려갔다. 보증금 중 1억2000만원은 LH의 지원금이다. 나머지 1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보험을 해약해야 했다. 지금 집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땅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LH는 반지하(지하 포함)를 공공주택으로 매입·임대하는 사업을 중단했다. 2015년 매입을 금지했고 2020년에는 공급도 하지 않고 있다. 세입자의 건강 악화와 침수 피해가 우려돼서다. 공공기관이 반지하를 사고 빌려주는 걸 멈췄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지하는 아직 남아있다. 김씨와 같은 이들이 반지하를 채웠다.
여름은 벌써 턱밑까지 왔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 뜨거울 거라고 한다. 대기가 달궈지면 증발하는 물도 많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더 많이, 더 거세게 내린다. 모두가 폭우를 걱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저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김씨는 말끝을 흐렸다.
그의 가족이 다가올 폭우에 믿고 의지할 것은 창문 밖 물가림막뿐이다. 창에는 대피가 어려운 방범형 창살이 달려있다. “구청에서 개방형 창살로 바꿔준다고 조사하고 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라고 김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씨는 “아내는 비가 (집으로)들어차면 대피가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휠체어를 타야 집을 나갈 수 있다. 비가 쏟아지면 김씨는 아내를 업고 계단을 올라야 한다.
김씨의 계약은 2024년 10월까지다. 그는 이곳에서 최소 두 번의 여름을 보내야 한다. ”일단 싸니까 왔는데 벌써부터 이러니 걱정이 커요. 돈이 더 있으면 지상으로 갈 텐데.” 김씨가 말했다. 현관 옆 창고의 역류 방지 펌프는 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현관과 문밖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유민지, 유채리, 차종관, 이예솔, 심하연 수습기자 cyu@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