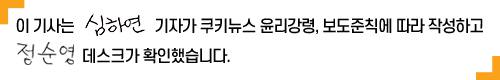포스코 회장 후보가 공개되면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및 공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31일 포스코그룹 CEO후보추천위(후추위)는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군을 6명으로 좁혔다. 내부 후보로는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 원장(사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후보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포함됐다. 포스코 출신 후보 3명과 외부 후보 3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 후추위는 모두 7명으로,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떠난 ‘호화 이사회’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또는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후추위가 외부 분위기를 의식해 후보 숫자를 내·외부로 3명씩 맞춰 기계적 균형을 선택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7년 대기업 최초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오너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이다. 이사회가 사실상 회장 연임 및 선임을 결정하는 구조다. 전체 이사회의 60%를 사외이사로 구성해 경영진과 이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는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전직 관료, 대학 교수, 법조인 등이었다. 이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부터 차기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지는 사외이사들이 주인 없는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같은 분산 기업은 CEO의 셀프추천, 셀프선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자율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다보니 이사회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포스코 사외이사의 입김이 다른 회사보다 센 이유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사외이사들로 꾸려진 후추위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이번 기회에 사외이사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사외이사가 바람직한 경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완전히 분리된 사업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그러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내이사들이 사외이사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를 견제할 감독기구를 세우고 회사의 방만 경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묵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회사 내에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로 올려야 하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을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12월 신지배구조안을 발표하고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의 후보 발굴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