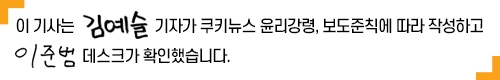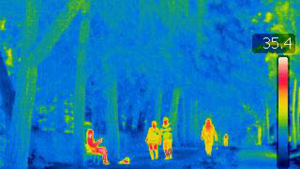“사실, 거절했었어요.” 담담한 목소리에 당시의 감정이 묻어나는 듯했다. 민감한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건 영화를 만드는 건 부담이 큰 일이었다. 이야기가 가진 메시지에 주목하자 비로소 영화 ‘교섭’을 연출할 결심이 섰다.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임순례 감독은 “‘교섭’은 다큐멘터리도, 시사·교양 콘텐츠도 아니”라며 영화를 만든 소회를 풀어놨다.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전대미문 사건. ‘교섭’은 피랍된 이들이 아닌,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에 초점을 맞췄다.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임순례 감독이 주목한 건 실화가 아닌 이야기다. 당시에도, 지금도 논쟁이 벌어지는 화두를 다룬 만큼 본래 취지가 흐려질 것을 염려해서다. 임순례 감독은 ‘교섭’을 대중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제작사로부터 연출을 제안받았을 땐 거절했어요. 큰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잖아요. 상업성과 대중성이 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시나리오가 나온 뒤 다시 보니, 한국영화에서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교적, 개인과 집단적 신념이 어디까지 유효한 것인지, 국가의 책임과 기능은 어디까지인지 질문하고 싶었어요. 유머러스한 캐릭터도 생겼더라고요. 묵직한 주제이지만, 상업적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실화를 영화화한 경험이 많지만 ‘교섭’은 접근법을 달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과정은 극비사항이었다. 국내에 아프가니스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도 없었다. 온갖 자료를 총동원해 당시 시대상을 구현하고, 캐릭터와 협상과정을 모두 창작했다. 협상에 성공하는 큰 줄기에 세부 이야기를 새로 붙여 영화를 완성했다. 요르단 현지에서 200명 가까운 스태프를 진두지휘한 건 새로운 경험이다. 도전을 함께한 황정민, 현빈, 강기영의 호흡은 그에게 큰 힘이 됐다.
“협상이 거듭 실패하면 긴장감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인물들이 대립하는 사이에 적절히 유머를 넣어야 하는 것 역시 숙제였어요. 그걸 잡아준 게 배우들의 연기였죠. 황정민과 현빈은 평소 친한 만큼 연기로도 좋은 호흡을 보여줬어요. 둘 다 사랑받는 배우지만 인기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런 이질적인 면이 ‘교섭’과 잘 맞은 것 같아요. 황정민 연기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서 잘 해낼 거라고 믿었어요. 현빈은 잘생긴 이미지보다 자유로운 느낌을 끄집어내려 했죠. 강기영은 웃음과 진지함 사이 균형을 잘 잡아줬어요.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잘 된 덕에 관객이 더 호감을 갖고 보더라고요. 시기적으로도 운이 따랐다고 생각해요.”
임순례 감독은 1996년 영화 ‘세 친구’로 데뷔해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감독 중 하나다. 그에게 ‘교섭’은 곧 확장이다. 전작인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하 우생순), ‘제보자’, ‘리틀 포레스트’와 ‘교섭’은 장르부터 분위기까지 판이하다. 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늘 갖고 있다. 영화 역시 그 관점에서 만들어왔다”면서 “초창기에는 영화에 대한 생각이 고착화돼 있었다. ‘우생순’부터 시대가 원하는 것에 발맞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짚었다. 언제나 비상업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교섭’을 만들었다. “무작정 화려한 액션보다 개연성에 맞는 액션을 만들려 했어요. 명분 있는 액션이란 기조 아래 새로운 구성을 많이 넣었어요. 흥미로운 작업이었죠.”

‘교섭’은 임순례 감독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는 ‘교섭’을 통해 블록버스터 영화(제작비 100억원 기준)를 최초로 연출한 국내 여성감독이 됐다. 영화계에 암묵적으로 드리웠던 유리천장을 깬 셈이다. 여성감독이 흔치 않은 시절 데뷔한 그는 후배 영화인들의 롤 모델로도 지목된다. 그가 영화판에 뛰어든 1990년대 초반엔 ‘여성은 꼼꼼하니 스크립터를 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했다. “스태프 30~40명 중 여성은 서너명 정도였던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여성이 50~60% 정도예요. 젠더적으로 달라진 거죠.” 과거를 회상하던 그는 영화계가 바뀌고 있지만, 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교섭’으로 적잖은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다.
“독립영화에는 여성감독들이 많아요. 하지만 상업영화로 오면 여성감독이 별로 없어요. 투자와 배급 시스템 문제예요. 작은 이야기보다 액션, 블록버스터가 영화관에 잔뜩 걸리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상업영화에서 입지를 다진 여성감독이 많아져서 고무적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진 감독들이 주류로 진출해야 해요. 그럴수록 다양성과 재미가 확보되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영화를 풍요롭게 살찌울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교섭’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죠. 최초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규모가 큰 영화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