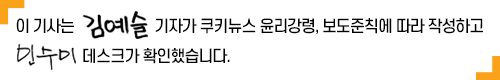[0.687]
글로벌 성 평등 지수 0.687. 156개국 중 102위. 한국은 완전한 평등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다. 기울고 막힌 이곳에서도 여성은 쓴다. 자신만의 서사를.

“기자님, 죄송하지만 아까 그 이야기는 오프 더 레코드로….”
현장에서 인터뷰를 나눌 때 오프 더 레코드 요청을 종종 받는다.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보도 및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말을 뜻한다. 오프 더 레코드라는 전제를 달고 나온 이야기는 기대만큼 은밀하지 않다. 여성으로 살아가며 혹은 여성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느낀 솔직한 생각들이다.
“…노력해도 현실은 비슷했어요. 방황도 했죠. 남성 캐릭터가 다양하게 표현될 때 여성 캐릭터는 한 가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다양한 책을 읽으며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죠.”
(*각색을 거쳐 대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일하며 겪은 좌절과 상실감, 그럼에도 이겨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성장. 이들이 조리 있게 꺼낸 말들은 오프 더 레코드 요청과 함께 노트북 하드 한쪽에 고이 묻힌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이유다. 여성 연예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하지만, 소속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일일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는 일도 많다. 개념녀 여부를 검열하던 2000년대를 지나, 82년생 김지영만 언급해도 집중 공격이 가해지던 2010년대를 거치면서 소속사들 역시 고민이 깊어졌다.
소속사는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여성 연예인을 보호하고자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한다. 다수 관계자는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배우 소속사 관계자 A씨는 “젠더 이슈가 사회 현상으로 확대된 만큼 자신의 성향과 생각을 하나로 정의하는 게 위험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배우에게 페미니스트 이미지가 생기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지지를 받긴 한다. 하지만 이후에 그가 말한 내용이 페미니즘과 반대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분다”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연예인은 인기가 중요한 직업인만큼 밉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크다”고 강조했다. 회사로서는 연예인이 모두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씨는 “당사자가 가치관을 분명히 피력하길 바랄 때에는 우리도 이를 존중해준다”면서 “연예인 대부분은 소속사가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납득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우도 있다. 한 배우 소속사 홍보팀에서 일했던 C씨는 취재진에게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지 않아 곤란한 일을 겪었다. 소속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확대 재생산되며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페미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C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어도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히면 욕먹을 만하다는 당위성이라도 생기는 것 같았다”면서 “그 일을 겪은 후 조금이라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말엔 오프 더 레코드를 부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변화는 쉽지 않다. 성 대결은 이미 사회현상으로 고착된 지 오래다. 이 같은 갈등은 여성 연예인에게 여러 잣대로 영속된다. 작품 속 여성 캐릭터들의 문제만 지적해도 ‘페미 같다’며 비난을 받는 게 단면적인 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페미니즘 개념을 오도하는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면서 “페미니즘은 성 대결이 아닌 모두가 행복해지자는 휴머니즘의 갈래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평론가는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다. 대중 평판이 중요한 연예인으로서는 더욱더 부담스러운 화제가 된 셈”이라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치 판단력과 성 인지 감수성 등을 키우고 ‘이대남’과 같은 무분별한 용어화에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