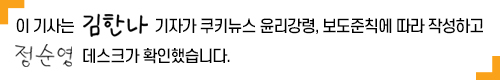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30일 찾은 이태원 일대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고 일대 상가들은 문을 닫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참사 여파 때문인지 영업 오픈 시간을 오후로 늦춘 가게들이 많아 보였다.
참사 이후 이태원 가게들은 추모의 의미로 영업을 접거나 휴업을 한 상태다. 이태원 일대를 둘러봤지만 잡화점이나 카페 한 두 곳 정도만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골목길 근처 대다수의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이었다.

참사 골목에서 30년 넘게 잡화점을 운영하는 상인 남 모씨는 눈 앞에서 참사를 직접 목격한 당사자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지켜봤다. 당시 가게 문을 개방해 부상자를 구한 의인이기도 하다. 이날 잡화점에서 만난 남씨는 “현재 영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문하는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면서 “참사 희생자들의 49제를 지낼 때까지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조문객을 위해서라도 가게 불만 켜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장사가 안됐는데 이번 일까지 터져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라며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내 눈 앞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갔는데 죄스러워서 장사를 못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참사 그날의) 트라우마가 생생하다. 젊은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에 잠도 못잔다”고 눈물을 훔쳤다.

인근의 다른 골목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상인 A씨도 참사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0년 간 한자리에서 가방 장사를 해왔다는 A씨는 “핼러윈 날만 되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광경을 수십년 째 봐왔는데 이번 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1번 출구로 출퇴근 할 때마다 (그날이) 계속 생각이 나 괴롭다”면서 “방문하는 손님들은 이태원 와서 밥도 먹기 싫다고 한다. 이제 이태원에서 약속도 안잡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이태원 일대는 다들 30~40년 오래된 상인들이 많다. 기존 단골이 깔려 있으니 영업을 하는거지 지금 와서 새로 매장을 오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이태원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참사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계의 끈을 놓을 순 없다고 했다.
실제 이태원 상권은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이전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참사가 일어난 해밀톤 호텔 주변 이태원 1동은 61.7%, 이태원 2동은 20.3% 떨어졌다.
유동인구도 1동은 30.5% 감소했고, 2동은 0.6% 소폭 줄었지만 매출은 감소폭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태원 곳곳에는 참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골목길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국화꽃과 음료, 추모 메시지 등이 비닐에 덮여 있었다. 추모공간 주변에는 경찰들이 배치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서울에는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에 달했다. 세찬 바람과 매서운 날씨 때문인지 추모를 하는 시민들을 찾아 보기는 어려웠다. 한적한 이태원 거리는 날씨 탓인지 더 썰렁하게 느껴졌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참사 현장을 찾은 20대 이 모씨는 아직도 지난달 벌어진 사고가 믿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 놀러왔다가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눈 앞에서 목격했다. 다행히 이 골목길 바로 위쪽에 있어서 생존할 수 있었다”면서 “심지어 그날 임산부도 봤었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마음이 너무 안좋더라. 추모할 겸 다시 찾았는데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