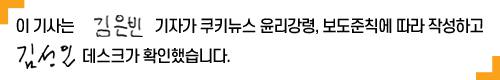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강원도 속초에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임신부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서울로 헬기 이송한 ‘원정 출산’까지.
의료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 의사인력의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의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 3개 사항에 합의했다.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 증원의 물꼬를 튼 셈이다. 양측은 적정 의사인력 추계를 위해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늘리냐’다.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증원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늘리지 않고선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우선 총량을 늘리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어도 1000명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이가 커져도 특정 인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은 그대로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사만 늘린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필수의료 부족 사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해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인기과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국장은 “단순히 정원을 300명 늘리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 늘릴 건지,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10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 지원을 받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도 “의협에선 수가 인상을 말하는데, 연봉 10억원으로도 외과의사를 못 구하는 지방 병원도 나왔다. 재정적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1000명은 늘려야 하고, 확충되더라도 필수의료와 비수도권 지역에 종사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무복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의협 관계자는 “지방에 산부인과가 적은 건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사 입장에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선호 경향이 강해 지방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별로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의사 수가 적어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고에 대해서도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어느 병실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면 된다”며 “현재는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는 시스템이라 이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 수를 늘릴 경우 부작용이 많다. 늘어난 의사만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 ‘의대 블랙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향후엔 의사 공급 과잉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