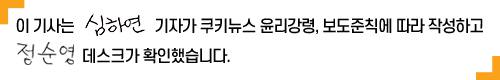얼마 전, 길거리 보세 옷가게에서 얇은 자켓을 하나 샀다. 하루 입고 나갔는데 어깨 부분 실밥이 나가고 소매 이음새가 헐렁해졌다. 1만2000원짜리 옷이었다. 아니,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했잖아. 황당했지만 재질이나 마감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산 내 잘못이려니 싶어서 버리기로 했다. 버리는 김에 안 입던 옷들을 같이 정리해볼까 싶어 옷장 깊숙이 묵어가는 옷들을 꺼냈다.
손이 안 가는 옷들엔 특징이 있었다. 유행 타는 디자인이거나, 번화가에 널려 있는 싼 옷이라 고민 없이 집어 들었던 옷이었다. 혹은 좋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진 한 철 짜리 옷이었다. 처음 샀을 때나 두어 번 입고 옷장 구석에 처박아 뒀다. 옷을 자주 사는 편이 아닌데도 버려야 할 옷들이 산더미였다. 쌓이는 옷만큼 죄책감도 커졌다.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이런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자연분해되지 않는다. 내 옷장 속에 평생 썩지 않는 쓰레기를 두고 산 셈이다.
천연 섬유를 사용한 옷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졌다. 일주일간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것들을 전부 빼고 살아보기로 했다.

내 옷장에 들어있는 옷을 죄다 꺼냈다. 옷장 하나를 다 뒤졌는데도 몇 벌 나오지 않았다. 70여벌 되는 옷 중 천연 소재만 사용한 옷은 11벌. 면이나 울, 린넨, 캐시미어 소재로 된 셔츠 몇 벌과 청바지, 가디건, 코트 정도였다.
선별된 옷들을 조합해서 입었다. 면 셔츠에 바지, 린넨 치마를 돌려 입는 식이었다. 이상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어색했다. 계절감도 맞지 않았다. 체험을 시작한 지난 3일 서울 최고기온은 22.4℃였지만, 체험을 마친 10일 최고기온은 9.1℃에 그쳤다. 일주일간 기온차가 심해 춥거나 더웠다. 패션 센스를 갖추는 건 더 어려웠다. 예쁘다고 생각해서 샀던 옷들은 대부분 화학섬유 소재였기 때문이다.
소재를 인지하고 입으니 특징이 보였다. 확실히 면으로 된 셔츠는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고 안감이 부드러웠다. 중공 섬유(섬유의 길이 방향으로 섬유 단면 안쪽에 구멍이 있는 것)인 면 특성상 가볍다는 장점도 있었다. 땀도 흡수가 잘 된다. 비싼 돈 주고 산 울 100%인 가디건은 두께에 비해 보온성이 뛰어났다. 린넨 치마도 얇지만 따듯했다.
그렇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린넨 소재는 ‘째려보면 구겨진다’는 명성답게 구겨짐이 너무 심했다. 울 가디건은 보풀이 자주 일었고, 면 셔츠는 보온력에 비해 무거웠다. 게다가 옷에 뭔가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았다. 의류업계가 무조건 천연 소재만을 고집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 소재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한 합성 섬유를 섞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탁이나 보온, 무게 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혼방한다.
내가 가진 옷들의 혼방률을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옷장에서 꺼낸 옷 30kg 중 6.6kg은 택(케어라벨)이 달려 있지 않아 어떤 소재가 쓰였는지 알 수 없었다.

보세 옷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근처 모 대학가를 방문했다. 여섯 군데 정도를 돌면서 확인했지만,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 스파브랜드 빼고는 옷에 케어라벨이 붙어있지 않았다. 직원에게 옷 혼방률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옷을 만져보던 직원은 “폴리랑…면 좀 섞인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했다. 정확히 어떤 소재가 얼만큼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법에 따르면 의류에는 소재나 보관방법을 알려 주는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통 과정 등의 문제로 사실상 규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대문에서 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 상인 A씨는 “중국에서 떼어 오는 물건에 (케어라벨을)일일이 박을 수는 없다”며 “케어라벨을 달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라벨비가 더 드는데, 유통되는 옷값이 너무 싸서 (돈을 들이기가)부담되는 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류 산업이 환경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화학섬유 사용을 표기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옷이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옷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케어라벨을 달기가 복잡하고 귀찮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패션업계의 무책임한 행동이 맞다”고 설명했다.

유행에 맞는 의류를 빠르게 공급하는 패스트패션은 오랫동안 문제가 됐다.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의류 폐기물은 연 8만톤 수준이다.
식당이 식재료 원자재를 밝히듯, 옷을 보면 어떤 소재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혼방률 표기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케어라벨에 쓰여진 본인이 구매하는 옷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재고하고, 옷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가치가 달라지면 의류 업계도 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소비는 더 이상 소수집단이 실천하는 캠페인이 아니다. 비건이 유행한 지는 오래고, 내가 먹고 입는 것들이 환경에 해를 덜 끼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잘 사고 싶은’ 소비자는 궁금하다. 내가 지금 걸친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어떻게 왔을까. 의류업계가 답해주길 바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