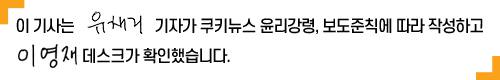엔에이치엔(NHN)이 ‘두레이AI(Dooray! AI)’를 공개했다. 후발 주자로 출발했음에도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관건은 민간 영역 확장력 증대다.
NHN은 15일 경기 성남 삼평동 NHN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근태관리, 메일, 결재, 포털 등 기업이 사용하는 기능을 서비스형 솔루션(SaaS)으로 제공하는 두레이에 새롭게 AI 기능을 더해 소개했다.
‘올인원’ 협업툴을 표방하는 두레이는 비교적 시장에 늦게 진출했다. 본격적으로 SaaS 시장에 출사표를 낸 건 지난 2019년이다. 네이버 ‘네이버웍스’, 카카오 ‘카카오워크’가 주로 활용되고 있던 시점이다. 당시 NHN워크플레이스 개발센터장이던 백창열 NHN두레이 대표는 “올해를 거점 확보의 해로 삼고 공공·금융· 건설 등 각 섹터에 선두주자 기업을 하나씩 유치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린 바 있다.
실제로 두레이는 편의성을 앞세워 다른 협업툴과 차별화를 꾀했다. 그 덕에 시장 점유율은 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 두레이는 계약 건수에서 49%, 계약 금액에서 68%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백 대표가 공언했듯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민간 부분에서는 보안이 중요한 금융권에 진입했다. 백 대표는 “금융권에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총 4개 기관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고 빠르면 12월 중에 결과가 나와 1월부터 두레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에서도 보안이 핵심인 국방부에 도입돼 스마트 협업 체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1월23일 기준 공공기관 100곳에 두레이를 공급하고 있다.
백 대표는 간편성을 두레이 차별화 지점으로 꼽았다. 기업 내부 시스템과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고, 추가 개발비 없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웹한글기안기를 통해 액티브엑스(Active X) 없이 결재를 진행할 수 있다. 내부 연계성·기능 자동 개선·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두레이AI에서도 편의성을 강조했다. 메일 요약과 일정 추가를 두레이AI에서 클릭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메일 내용에 한정해서 질문하고 답변 받기도 가능하다. 사이드 채팅을 통해 일상 소재에 대해서도 AI와 대화가 가능하다. 해당 내용을 위키에 등록해 발표 자료로 만들 수도 있다.

쉽게 사용해 유용하다는 게 백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두레이AI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비스와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고, 감사 기능이 있어 로깅과 패턴이 검출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채팅 형태 입력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간 LLM에 입력한 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활용 돼 다른 이용자에게 누출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그는 “고객사 보안 환경과 업종에 따라 맞춤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하나의 LLM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오픈 AI부터 고객사 내부 LLM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포용하며 다양화를 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용 측면도 차별화 지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록규 NHN AI기술랩장은 “이용자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형언어모델(sLM)을 활용하되, 성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민간 영역에서 확장성을 키우는 것이다. 민간은 SaaS를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광범위해 오히려 공략이 어렵다. 박형민 NHN두레이 사업부장은 “홍보·마케팅에 무제한 예산을 들일 수는 없다”며 “전략적으로 파트너 사업을 전개해 (두레이만의) 특장점을 강조하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백 대표는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을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며 “국내 협업 SaaS 시장이 매년 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련 기능을 지속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업무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두레이AI를 발판 삼아 협업툴 시장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지금은 IPO에 대해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며 “2~3년 내를 가시권으로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