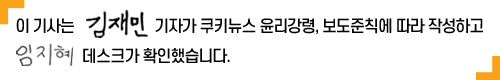이재명 정부가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관련 핵심 사업인 영농형 태양광의 법제화가 정작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어 현실적으로 확대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8년 시한부 영농형 태양광’, ‘들쭉날쭉 태양광 이격거리’ 등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54건을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작물을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디어로,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다.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소 수명에 비해 턱없이 짧아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당초 농지의 본래 목적(식량 생산)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임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다각화가 중요한 시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이 되기도 해 농가에서도 보급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법안 마련 행보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2020년 6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시 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21년 11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약 1년간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만 7건이 발의된 상태지만, 이 중 2건만 소건위 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으며 나머지 법안은 접수조차 되지 못했다.
법제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안팎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농지 투기 사례 등 기본적으로 농지를 용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수적인 접근이 저변에 깔린 데다, 농업계와 지역사회 등에서 태양광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여전히 높은 난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양광 이격거리(도로·주거지역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거리) 규제를 강화한 경남도 소재 지자체의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농지 감소,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미 농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사유지에 태양광까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가 답보 상태다 보니 기본적인 사업성·수익성 확보는 물론, 다음 스텝인 인허가 절차, 송전설비 연계, 주민수용성 강화 등 실현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의 사용허가기간을 최대 2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의결했지만,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 체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다음 절차가 무기한 연기됐다.
탄녹위의 바통을 넘겨받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법적 근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도입전략에는 사용허가기간 연장 외에도 공익직불금 적용 확대, 지속적인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용이 담겨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최대 20년간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안에 힘입어 4000곳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고 수익성도 보장돼 있다”며 “새 정부가 햇빛연금 제도를 확대하려면 주요 이행 수단이 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법제화부터 빠르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