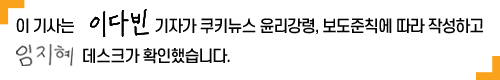농어촌 ‘무약촌(약국 없는 지역)’의 상비약 접근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4시간 운영 요건 탓에 상비약을 취급하지 못하는 농어촌 편의점이 많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밤이나 주말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정과 품목 확대를 통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국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 중 약 500여 곳의 무약촌에서 상비약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대상 점포는 연중무휴·24시간 운영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비약을 판매하지 못하는 점포는 2024년 말 기준 △CU 약 3100곳(전체 1만8458개 중 16%) △GS25 약 4270곳(1만8112개 중 23.6%) △세븐일레븐 약 2240곳(1만2152개 중 18.5%)에 달한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규모 주거지 등 읍·면 지역은 야간 수요 부족과 심야 근무자 확보 어려움으로 24시간 미운영 점포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전기료 등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점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CU의 경우 24시간 미운영 비율이 전년 대비 0.7%포인트(p) 늘었고, GS25는 2020년 16.7%에서 지난해 23.6%로 상승했다. 읍·면 지역을 포함해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할 때 가까운 편의점에서조차 구입하지 못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심보다 약국·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편의점조차 상비약을 취급하지 못하는 것은 ‘편리성 제고’라는 약사법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공장 등 특수 입지뿐 아니라 인구 수요가 적은 읍·면 지역 점포 다수가 24시간 미운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매출뿐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 상비약 취급 점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국 또는 상비약 판매점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 조례로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비약 품목 확대와 생산이 중단된 품목에 대한 대체 지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판매제도 도입 당시 약사법은 상비약을 20개 품목 이내로 제한했고 현재 편의점에서는 감기·해열·진통제 7개, 소화제 4개, 소염제 2개 등 총 13개 품목을 판매 중이다. 그러나 ‘타이레놀 80mg·160mg’ 생산이 중단되면서 실제 취급 품목은 11개에 그친다.
업계는 안전성이 높으면서 긴급성이 큰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인공눈물 등을 추가하고, 생산이 중단된 타이레놀 대체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상비약은 하루 매출의 과반이 밤부터 새벽까지 발생하며 요일별로는 토·일요일 비중이 높고 명절·공휴일에는 100% 이상 늘어난다”며 “약국이 문을 닫는 밤이나 주말에 수요가 집중되는데, 약국이 멀리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하게 약을 구할 편의점도 없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