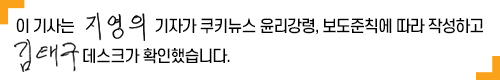| ① “그날, 우리 삶도 함께 붕괴됐습니다” ② 54번 버스 기사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③ 눈물 채 마르기도 전에...12명 더 세상을 떠났다 ④ “과태료 부과하면 되지” 공무원 안전불감증 |

참사는, 도시 전체를 상처 입혔다.
붕괴사고의 잔재는 무너진 자리에만 있지 않았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트라우마(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남겼다. 여전히 사고가 났던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 기사, 붕괴된 잔해를 지나는 다수의 시민이 정의 내리기 어려운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운림 54번 버스, 눈 감을 수 없는 고통
“그날, 미동 없이 구급차에 실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운림 54번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6월 눈 앞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였다. 불과 십여 분 앞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앞에 멈춰 있었다. 그의 동료 기사 B씨가 몰던 버스였다.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넘어지더니 버스 위로 무너져 내렸다. 버스에 탔던 이들 중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뉴스로 들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버스를 몰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이후 이유 모를 불안과 압박감 속에 쉬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 시작됐다.
지난 달 21일 광주 매곡동 54번 버스 종점에서 만난 A씨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그 현장을 지날 때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 괴롭다”고 털어놨다.
참사가 있었지만 54번 버스 배차는 멈출 수 없었다. 운림 54번 버스는 광주 시내버스 중에서 운행 횟수가 많은 축에 속한다. A씨를 포함한 54번 버스 기사들은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사고 현장을 지난다. 기사들은 말했다. 그 버스에 자신이 타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고.
광주시는 붕괴사고 이후 시민들의 충격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운림 54번 기사는 “충격을 가라앉힐 틈도 없이 바로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운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불안을 가라앉힐 틈을 주지 않았다. 나나 다른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그 버스에 탔던 기사가 아니니 휴가를 내고 가기도 뭐 했다. 혹 회사로 상담 부스라도 보내준다면 모를까, 가기 쉽지 않다. 한두 번 상담 가서 뭐가 달라지나 싶어 그냥 불안을 참아냈다.”
그는 “붕괴 잔해 앞을 지날 때마다 이를 악문다. 반강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 54번’을 운전했던 기사 B씨는 회사를 떠났다. 동료 기사들은 그가 떠나기 전 남긴 사고 날에 대한 고백을 전했다. 그는 찌그러진 버스의 운전석에 갇혀 있었다. 사고 이후에도 사람들의 도와달라는 비명을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만 했던 기억의 고통에 시달렸다.

파편이 눈앞으로 날아왔다
사고현장 바로 앞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임모씨(53세)도 붕괴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했다. 사고 날의 기억은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5층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버스를 덮쳤다. 파편이 무너진 건물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그의 가게 앞 유리창까지 날아왔다.
임씨는 “그날 이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철거하는 곳을 보면 바로 피해간다. 큰 건물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가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참사에 큰 충격을 받은 그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
임씨는 “나처럼 사고의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도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걸(사고 이후 감당해야 했던 충격과 불안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어디서 도움받으라고 알려주는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개월째 무너진 건물 잔해로 가득한 사고 현장을 보며 근무하고 있다.
사고 이후 6개월. 사람들은 아직 사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증언과 목소리에 채 씻어내지 못한 그날의 공포와 불안이 배어났다.
학동에 거주하는 김정애(가명, 50세)씨는 최근 큰소리를 들으면 아이를 끌어안는 습관이 생겼다.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은 물론, 구급차 소리만 들어도 자신도 모르게 아이 손을 잡아채게 된다. 그는 붕괴사고의 순간, 아이와 함께 그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사고 날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신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나니 눈앞에 무너진 잔해가 널려있었다. 사고 현장과 거리가 있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김씨는 “혹시라도 조금만 빨리 걸었더라면 건물 잔해에 깔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아이는 다리가 좀 불편하다. 아이가 제때 피할 수 없었을 테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끌어안는 것밖에 없지 않았겠나”고 토로했다.
붕괴사고는 광주 시민들에게 정의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럼에도 시민들 중 시가 지원하는 상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은 일부에 그쳤다. 대부분 안내조차 받지 못했거나,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트라우마를 어설프게 덮었다. 그저 인내하며 기억 속 상처가 무뎌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랐다.
학동에 거주하는 조선대학교 학생 김모씨(22세)는 “그날 나갈 일이 있었다가 우연히 취소되어서 집에 있었는데, 근처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뉴스에서 내 또래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사고 난 현장은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난다. (시민들에 대한) 사고 회복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그저 이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