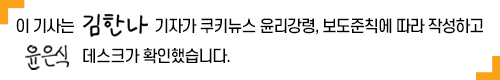'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후폭풍이 거세다.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올해 말로 연기됐지만 파장은 여전하다.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만 더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환경단체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1일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곳곳에서 여전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부담을 현장으로 떠넘긴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박 모씨는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개선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걸 알지만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다"면서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제도 실행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개인 자영업자가 모두 떠안게 돼 있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인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률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총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 전국 3만8000여곳에서 시행된다.

한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게시글에서 한 작성자 A씨는 "일회용컵을 줄이기 원한다면 점주와 직원들의 돈과 노동을 강요하는 보증금제가 아닌 컵 판매제로 가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커피 일회용컵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컵 보증금제를 시행해도 보증금을 찾아가기보다 잊어버리는 소비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로지 카페의 공짜 노동과 시간 소비만을 강요하는 정말 잘못 설계된 제도"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작성자 B씨는 "고객이 보증금을 반납 안하면 환경부가 300원을 가져가는 흑자 구조이고 소상공인만 카드수수료, 부가세, 인력 비용만 증가하는 꼴"이라며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도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음료 가격 3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를 애용한다는 남 모씨(여·36)는 "커피값도 5000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컵보증금으로 300원을 더 줘야 한다면 누가 구매할까 싶다"며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은 개별 매장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른 매장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으며,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이번 보증금제가 첫번째 시도는 아니다. 정부는 2003년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소비자 참여가 저조해 5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환경단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재 일회용 컵은 재활용 비율이 5%에 불과한데 라벨이 부착된컵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본사는 컵 생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심지어 비용 부담까지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소통의 부재도 문제"라며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증금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