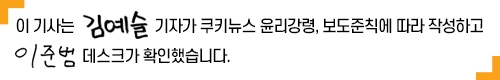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욘더’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득한 작품이다. 공개 전 SF와 휴먼 멜로 장르로 소개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이 달랐다. 지난 25일 화상으로 만난 이준익 감독은 ‘욘더’를 판타지 휴먼 멜로 미스터리 호러라고 소개했다. “SF면서도 SF가 아니고, 멜로가 아니지만 멜로인 작품입니다. 공포나 스릴러는 아니지만 미스터리의 결을 가졌지요.” 경력 30년에 다다르는 그에게도 ‘욘더’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이다.
‘욘더’는 재현(신하균)이 죽은 아내 이후(한지민)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메시지를 받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후가 사는 죽음 이후의 세계, 욘더. 재현은 욘더에서 이후와의 사랑을 재현할 수 있을까. 경계심과 호기심의 중간 지점에서 출발한 ‘욘더’는 이후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안긴다. 만 개의 천국이 아닌 만 개의 고립. 극 말미 재현의 일갈은 ‘욘더’가 품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준익 감독은 “욘더는 호기심으로 향하는 이기심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욘더’는 이기심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후는 염원하던 아이를 임신하지만 죽음을 맞죠. 이건 선택이 아닌 운명이에요. 운명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후는 죽음 이후를 설계하겠다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남편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만 개의 천국인 줄 알고 욘더로 갔지만, 그곳은 각자의 천국이고 각자의 고립이에요. 이후가 닫지 못하는 문은 재현이 닫아주죠. 누군가가 재현이 닫지 못하는 문을 닫아줄 수도 있겠고요. 그게 바로 ‘욘더’로 담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추상적인 관념이다. 이준익 감독은 조심스럽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이 감독은 2011년 출간 소설 ‘굿바이 욘더’를 접하고 꾸준히 영상화를 시도했다. 그를 번번이 가로막은 건 장르의 벽이었다. 블록버스터 세계관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강박에 기껏 써 내려간 시나리오를 폐기하기 일쑤였다. 시간이 지나며 이 감독의 생각은 달라졌다. “원작 속 핵심 요소는 온전히 가져가면서도 간결하게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도와준 거죠. 지금은 생각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해야 할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지금의 ‘욘더’가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이 감독은 “나름대로 성장한 순간”이라고 평했다.
“‘욘더’가 죽음을 다루는 만큼 진지하게 접근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소멸하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생각의 타래들이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한 동력이었어요. 제가 사극 아닌 근미래 배경의 작품을 한다고 많이들 놀라더군요. 사극도 엄밀히 말하면 판타지예요. 실존하지 않잖아요. 근미래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와 미래는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들은 언젠간 죽잖아요. 여느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욘더’는 영화만 14편을 찍은 그가 시도한 첫 OTT 시리즈물이다. 매 순간 두 영역의 호흡이 다르단 걸 체감했다. 한편으론 러닝타임 2시간의 압박감에서 해방된 기억이 남았다. 이 감독은 “영화가 압축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드라마와 시리즈물은 압축을 덜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더라”며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이야기를 그려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는 조금만 지루하면 바로 다음 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인물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드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반면 시리즈물은 지루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을 침착하게 밀고 갈 수 있어요. 사실, 지루함과 침착함은 궤를 함께하는 단어거든요. 같은 장면을 봐도 누구는 지루해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차분하고 침착하다고 해요. 결국 개인차인 거예요. ‘욘더’는 1부에서 침착하게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하면 후반부 이야기에 적응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에 일부러 재현의 내면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OTT 플랫폼이었기에 가능했죠.”
이 감독은 ‘욘더’ 시나리오 작업을 이어갈수록 이야기에 좁고 깊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OTT 행을 택했다. 반응도 꼼꼼히 찾아봤다. “‘욘더’는 세대차가 큰 작품이에요. 20, 30대 관객은 일상에서 죽음을 접할 일이 적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충분히 몰입도가 갈릴 수 있죠. 지루하다는 반응도 이해해요. 그럼에도 ‘욘더’로 진지하게 토론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기뻤습니다.” 이 감독에게 ‘욘더’는 도전의 장이자 고민의 순간으로 남았다. 회차마다 분량을 30분으로 설계한 것도 그에겐 새로운 시도였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단계적으로 뻗어가는 이야기를 현실에서 표현하려는 의도로 택한 결과다. 이 감독은 “죽음이란 아름다운 이별”이라며 “‘욘더’가 다양한 생각의 계기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단단해져요. 아름다운 이별을 꿈꾸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극 중 이후와 현재는 각자의 고립과 각자의 천국으로 향해요. 불멸의 아름다움을 알면 소멸의 아름다움도 자연스레 알게 돼요. 왜 우리는 늘 아름다운 만남을 이야기할까요. 아름다운 만남보다 소중한 건 아름다운 이별일 텐데.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욘더’가 그 계기이길 바라요.”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