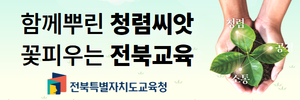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구감소에 허덕이는 전북 익산시가 현행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 선거구는 오늘(31일)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실적으로 익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하한선이 충족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상한은 27만 8천명, 인구하한은 13만 9천명이었다.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되면 의석수가 사라진다. 이럴 경우는 의석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역간 도시를 묶는 합구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2개 선거구 유지에 필요한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익산시의 경우 인접한 전주시나 완주군, 군산시, 김제시 등과 묶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한 달 전인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7만 369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인 4416명이 줄었다. 인구하한선이 21대 총선처럼 13만 9천명으로 정해진다면, 인구감소 추세를 볼 때 현재 갑과 을로 나뉜 익산시는 5천명 가까운 인구가 부족해 하한선에 못 미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비례만으로 이뤄지진 않는다. 여야 정치협상에 따라 인구수 기준이 더 낮춰질 수 있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결정하는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방식으로 선거구가 확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차선책으로 기본적적으로 인구하한선에 못 미치는 익산지역 선거구 2곳을 지키기에는 버거운 형편이다.
더욱이 익산시의 인구정책은 선거구 유지가 생명줄인 정치권의 절실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 인구 30만명이 무너진 후 감소세 극복을 위해 2021년 ‘행복플러스 익산 2630’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인구 30만명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익산시는 머지않아 효과가 나올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익산시의 올해 인구정책도 지난해 정책 일부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증가세 전환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앞서 익산시가 지난 25일 발표한 ‘지역정착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익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8∼39세 청년 중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임·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소득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재직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 전부다.
전북도 역신 지난 29일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농업, 중소 제조업,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임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까지 대상 분야를 확대해 청년 1천명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익산시와 비슷한 지원책이다. 청년들이 굳이 익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익산시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해 인구증가를 견인하려던 구상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개발공사가 익산 부송 데시앙의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분양대상 727가구 중 120가구만 청약돼 청약률이 16%에 그쳤다. 익산시에는 2026년까지 1만 1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 공급될 예정인데, 인구증가는커녕 미분양 속출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한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명일 때와 두 명일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면서 “익산시도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정책들로만 일관한다면 인구감소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빼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