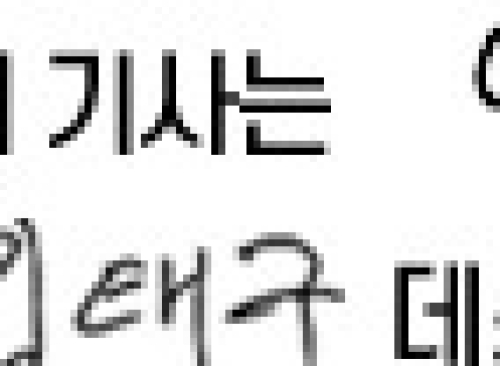2022년 10월29일 친구들과 핼러윈 이태원 구경을 나선 아들은 그곳에서 친구 2명을 잃고 혼자 돌아왔다. 10·29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 중 마지막 희생자인 이(당시 16세)군은 참사 43일 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참사가 일어난 지 450일이 지났지만, 유족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다.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아직이다.
이군 어머니 송해진씨는 “추모 공간은 시민들이 참사를 상기하는 물리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추모 공간을 정비하고 보수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법이나 규정이 없다면 임시 공간에 불과하다. 단발성으로 (추모하고) 없어질 공간이 아니라 계속 공간이 유지되려면 이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는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았지만, 기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많지 않다. 영구적인 추모 공간 마련까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지방에 유일하게 남은 전북 전주시의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해 11월 지자체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유족 등의 반발에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 마련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추모 공간은 지난해 7월28일 자취를 감췄다. 상권이 침체와 취객 행패 등의 이유로 상인회 측에서 현장 정리에 나선 것이다.
어렵게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도 존재 자체마저 잘 알려지지 않아 잊히기 십상이다. 앞선 보도(한국의 참사 기억법, 추모 공간은 지금[참사, 기억①])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참사 위령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위령탑,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 추모 동판 등 참사 현장과 동떨어져 있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워 시민들에게 잊힌 현실을 꼬집었다.

해외에서 대규모 참사를 추모하는 방식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추모 공간을 두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겪는 한국과 달리 참사 현장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는 그대로 추모 공간이 됐다. 붕괴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는 2개의 인조 연못이 마련됐다. 연못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추모비에는 희생된 279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깊이 9m의 인공 폭포로는 애도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참사 발생 후 일상 회복을 위해 추모 공간을 축소하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추모 공간은 유족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시민들도 국가적 참사를 기억하고 공유하면서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 일각에선 참사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추모 공간 필요성과 함께 추모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과)는 “추모 공간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며 “집단마다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참사에 어떤 추모 공간을 만들 것인지는 정치적, 사회적인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과)도 “관련 법률상 추모 공간 관리나 조성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치적으로나 당파적으로 추모 공간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 기구 구성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모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국민 기대와 인식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모 공간) 표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솔 임지혜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