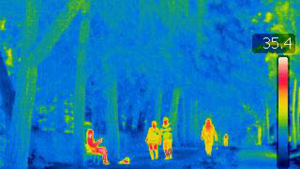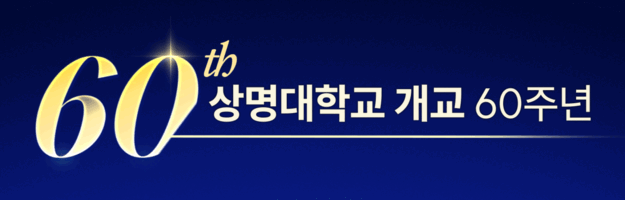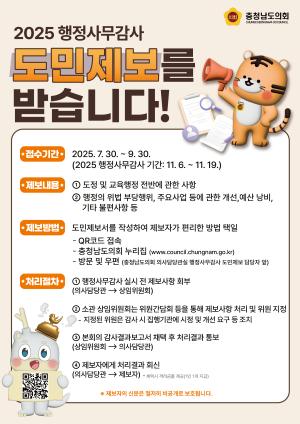그러나 완벽하리만치 정확하고 철저했던 어머니에게도 허점이 있었는데, 매년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식들의 기가 죽을까 봐 ‘아버지는 미국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미 엄마의 엄포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외로움을 알아 일찍 철이 들었던 자식들은 그런 거짓말을 모르는 척 넘어가 주었고, 어머니는 당당하게 성장한 아들딸을 보며 형사처럼 엄했던 당신 모습을 훈장처럼 여기기도 하셨다.
내가 시집을 온 뒤, 나에게 어머니는 솜씨는 최고지만 좀 엄격한 집사 같았다. 김치에 밑반찬에 양념까지 챙겨주시고 해 주실 건 다 해 주시는데도 가까이하기 어려운 최 고참 집사.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자식들에겐 형사처럼, 내겐 집사처럼, 늘 강하고 힘센 모습만 보이며 사느라 당신의 가슴 같은 건 우리에게 속도 겉도 보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혼자 해결하셨던 어머니가 내게 의지하게 된 것은 정신이 흐려지신 뒤부터였다. 현관문 열쇠를 잃어버리듯, 어쩌면 꼭꼭 잠가두셨던 마음의 자물쇠도 잊으신 건지 어머니는 그렇게 허물어지고 나서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돌아서면 깜빡깜빡 잊으시니 아픈 것도 잊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갔던 것도 잊으며, 어머니와 나는 어디도 안 아프고 어디도 안 다녀온 듯 서로를 속이고 속아주고 지냈다.
최근, 시어머님은 유방암 확진을 받으셨다. 이미 괴사가 일어난 어머니의 가슴을 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92세의 어머니도 여자였다는 것이었다. 근 60년 동안 미망인 가장으로만 살아온 어머니가 좀 더 아내와 여자로 사셨다면 어머니는 당신의 이상을 더 일찍 깨달으셨을까. 나도 더 빨리 눈치챘을까.
암이 어머니를 잘 속인건지, 이번엔 어머니가 우리를 제대로 속인 건지, 너무 늦게 알아서 손을 쓸 수도 없는 어머니의 암 덩어리를 내 가슴에도 무겁게 얹고, 나는 어떡하면 이제야말로 내가 어머니를 잘 속일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제 할 일만 하는 의사가 어머니 앞에서 암이라고 말하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을 때, 나도 엄격한 형사나 집사처럼 ‘그 암은 어머니가 아는 그런 암이 아니고, 병원에선 검버섯도 암이라고 부르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어머니를 윽박지르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되어도 어머니는 그걸 곧 잊으실까. 병이 더 깊어져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우리는 서로를 잘 속이고 속을 수 있을까. 남편이 마음을 감추고 문득 ‘어머니랑 어디 멀리 드라이브나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머리가 하얗게 센 환갑의 아들을 바라보며 백발의 92세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무 걱정하고 애쓰고 그러고 살지 마라. 안 그래도 다 살 수 있어. 참 좋은 세상이다,”
이미 치매가 오신 시어머니가, 정신이 그러면 몸이라도 아픈 걸 모르고 그저 조금만 더 편히 지내다 가셔도 될 굳이 그 연세에 이러고도 참 좋은 세상이라니, 대체 저 뜬금없고도 정연한 말씀들은 무엇인지… 제사를 지내면서도 아버진 미국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던 어머니의 거짓말이 다시 시작된 건지… 나는 속고 싶어도 이번엔 속아줄 수 없는 어머니의 거짓말이 왠지 시처럼 느껴져 그냥 듣기만 하였다. 평생 과부에 형사에 집사로만 살아온 어머니의 처연한 시….
유난히 석양이 아름다운 날이었다. 매일 다시 뜨는 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는데, 일생에 꼭 한번 피고 지는 시 같은 당신들의 석양은 왜 아름답게만 저물면 안 되는지, 누구에게라도 묻고 싶은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