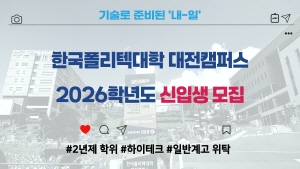내가 탈 버스가 도착했을 때, 난 친구에게 우산을 들려주었다. 그 시절, 나는 비를 좋아하고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 온 몸을 적시는 것도 좋아하였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동네 정류장 앞 약국으로 뛰어들어 엄마에게 우산을 가지고 나오시도록 전화를 걸 수도 있었다. 그래도 차마 친구에게 ‘엄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너는 어쩌려고 그러냐는 친구에게 나는 버스만 내리면 정류장 바로 앞이 집이라고 말하였다. 그뿐이었다.
이후 가까워진 친구와 하루는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마침 그날도 비가 내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산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며 버스를 내려 걷기 시작했을 때, 친구가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우리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더 걸어야 하는 곳에 있었다. 좀 더 가야 된다고 앞장서 걸었을 때, 뒤따라오던 친구가 멈춰 서며 물었다. “너, 왜 그 때 나한테 우산 빌려줬니? 날 동정한 거니?”
그대로 돌아서 가는 친구를 먹먹히 바라보다 나도 등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빗물은 우산으로 가려도 눈물은 우산으로 가릴 수 없었다. 눈물에도 그 이유에 따라 농도가 다르다면, 슬플 때보단 서럽고 안타까울 때 더욱 진한 것 같았다. 눈물은 정말로 짰다. 빗물로 눈물을 감추기 위해 우산을 접고 비를 맞았다.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흐려진 시야로 전봇대에 부딪쳤을 때, 전봇대 밑 조그만 물웅덩이는 기름이 어려 무지갯빛이었다. 땅에 떨어진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늘에 선연했던 무지개를 잊듯 그 친구를 지웠다.

이제 막 물오르기 시작한 젖멍울처럼, 우린 둘 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사춘기였다. 그 애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애의 상처를 가슴 아파도 했다. 그러나 내가 주고 싶었던 마음마저 그대로 받아주지 않은 그 친구가 야속해 나도 오래 앓았다. 어떻게 했어야 그 친구의 마음을 안 다치고, 그러고도 그 애가 찬비 맞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했을지 다시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정답을 알 수 없었다.
사람에게 받은 첫 상처였다. 그 애에겐 어쩌면 내가 준 상처였을 수도 있다. 그때부터 나는 그전의 나와 달라졌다. 어쨌든 너와 내가 같으리라는, 결국엔 우리 모두 통하리라는, 막연하나 순수하고 견고했던 믿음의 어린 시절은 끝났다. 그리고 그 완벽한 믿음이 없으니 마음을 열거나 줘야 할 땐 미적거리고, 접거나 돌려야 할 때도 주저하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서툴렀고 본의는 종종 전해지지 않았다.
이즈음, 유난히 잦은 비를 보며 다시 그 친구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금은 이미 헤어졌거나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슬프게 했거나 내가 아프게 했을 사람들을 떠올린다. 보이지 않는 마음만큼 전하기 어려운 게 또 있던가. 서로 바라는 것의 모양과 온도와 속도는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나누는 것이 단지 시간과 공간만이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음임을 함께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