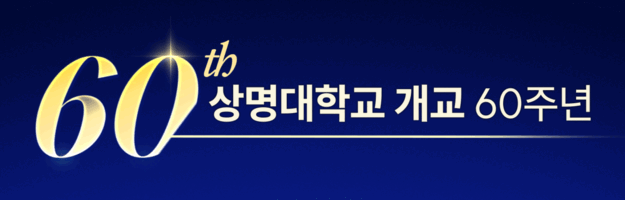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다. 온전한 자들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다. 자신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틀어쥔 사람들은 외부의 권력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분리를 권한다. 그러면서 사회는 우리들의 삶을 파편화시킨다. 사회구성원들끼리 서로 싸우게 한다.
이렇듯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면서 터무니없는 대가를 치른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나의 감정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쉽게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이 그 출발은 '나 자신과의 관계'로부터다. 내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 내가 남에게 하는 행동이다.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자세히 보면, 자연도 완벽하지 않다. 다만 변화하고 순환할 뿐이다. 완벽한 생태계가 있지 않다. 서로의 죽음으로 서로를 살리고, 어디선가 균형이 무너지면 어디선가 균형을 다시 세운다. 그저 '균형 찾기' 이다. 균형 자체가 되면, 그건 죽음이다. 하나의 상태에 이른 순간은 죽음일 뿐이다. 자연은 멈춤이 없다. 삶도 그렇다. 멈추지 않는다. 삶 안에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고, 혼란과 질서도 함께한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이다. 삶의 반대말은 멈춤이고, 죽음이자, 완벽함이다.
사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조종할 능력을 주는 '객관적인' 지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일에 소홀하다. 앞에서 말한 객관적 지식은 세상을 주무르고, 조종할 능력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오히려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 이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나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한 가지에 집착한다는 뜻은 균형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분리되지 않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길 원한다면 믿을 수 있는 관계,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기기만 능력이 아주 뛰어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사는 법’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공동체에서 다음과 같이 살고 싶다. 아무리 사소한 고민도 자기 일처럼 잘 들어 주고 맞장구쳐 주는 사람,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웃길 바라는 사람,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 해도 억울하다고 하면 무작정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며, 나머지 90%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된다.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다. 다 사는 거 비슷비슷하다. 실력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활동으로 관계를 넓혀가고, 그 관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 태도와 활동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생활의 편의를 위한 도구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가슴의 헛헛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무덤덤할 뿐 좀처럼 감탄할 줄 모르는 정신의 혼수상태에 빠진 이들이 의외로 많다. 도로테 쥘레는 이런 이들을 '고장난 존재'라 했다. 지향조차 분명치 않은 길 위에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달려간다. 그런 내달림 속에서 공허함이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낯선 존재를 발견한다. 존재의 불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은 공적인 역할의 세계와 감춰진 영혼의 세계 사이를 오가면서 분리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분리된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이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영혼과의 접촉을 끊고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 속으로 숨어들기 일쑤다. 하지만 참된 삶은 자기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열린다. 파커 파머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일러 '신뢰의 서클'이라 했다.
그 모임은 값싼 위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바로잡으려 들지도 않는다. 조용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의 영혼의 소리를 경청할 뿐이다. 옛 성인은 우리가 대지를 딛고 서기 위해서는 다만 몇 평의 땅만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실제로 쓰지 않는 땅을 모두 파 없애 버리면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주위가 온통 벌어진 틈이고 허공이라면 누군들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성인은 그 이야기를 통해 '쓸모없는 것의 쓸모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기쁜 일이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누구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다.//별을 빛나게 하는/까만 하늘처럼."
세상은 내게 '충고'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내 가슴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들어야 한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그때마다 상대방은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곤 한다. 바로잡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그가 심리적인 참호 속으로 퇴각하면,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만다. 그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은 날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신뢰의 서클> 안에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음 그 자체로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일상의 순례길을 걷는 것이다. 그 순례길을 걷는 사람은 구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