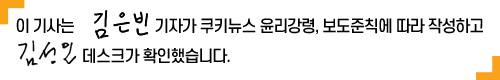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억 단위로 지급하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 급여’와도 중복되는 성격이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숙고를 갖고 자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앙·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 효과는 대개 시행 당해 또는 그 이듬해까지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유배우 출산율을 결과 지표로 설정한 후 합성통제기법을 활용해 출산 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인천의 경우 출생아당 100만원의 출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 2018년의 정책 효과가 7.3%였다. 그러나 2019년 6.8%, 2020년 2.1%로 점차 감소하다 2021년엔 아예 사라졌다. 광주 역시 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해 2년에 걸쳐 총 580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 시작한 해당 정책의 효과는 12%가량으로 조사됐는데, 2023년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출산 지원금 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이런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출산 지원금 액수가 크게 오른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다음해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출산 지원금 규모가 작은 대도시의 기초 지자체에선 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발표한 ‘억 단위’ 출산 지원금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천시는 ‘1억+아이드림’ 정책을 통해 2024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만 18살이 될 때까지 기존 정부·인천시 지원을 포함해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1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경남 거창군은 1억1000만원, 충북 영동군은 1억2400만원을 각각 내걸었다.

문제는 이런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이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부모 급여’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3년부터 이뤄진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대체해 도입됐다. 올해 기준 부모 급여는 0세와 1세 아동에 월마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진은 “부모 급여가 도입되면서 지방 정부의 출산 장려금 및 양육 지원금과의 중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도입 당시 협의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부모 급여가 시행되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출산 장려금 및 양육 지원금 규모를 줄일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지방 간 공식적 협의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2023년 출산 지원금을 없앤 광주광역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금을 유지했다. 보고서에는 “지자체 담당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수당 정책을 별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 정부의 현금수당이 증가하더라도 지자체는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의 지원금이 선도적으로 나온 정책이고, 이후 중앙 정부 차원의 부모 급여가 나왔다”며 “원래 중복 급여 성격의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는 지방 재정 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강제로 폐지하라고 하긴 어려운 구조가 있다”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선 마을 돌봄 구축,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지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