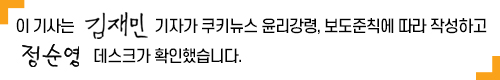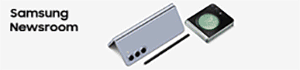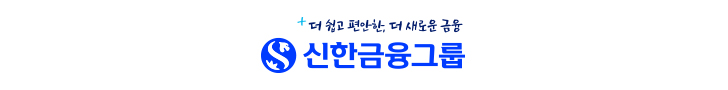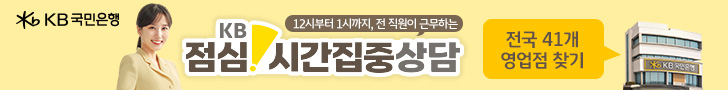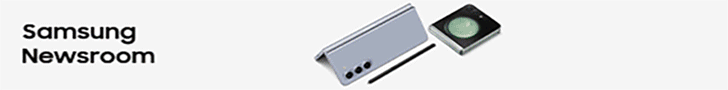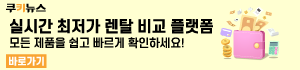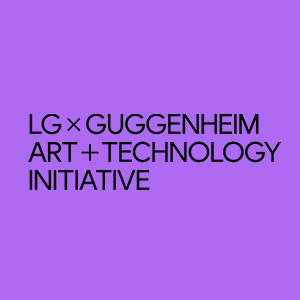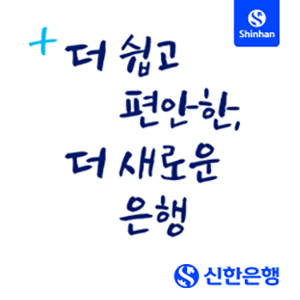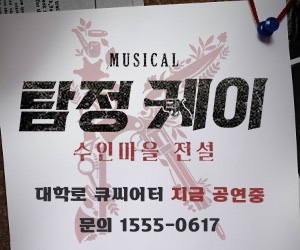전력 송·배전망 인프라 확보가 다소 더딘 가운데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확보돼야 할 ESS 규모가 작아 보급에 더욱 속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한국남부발전-탑솔라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국내 최초 중앙계약시장형 장주기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착공에 돌입했다. 규모는 92MWh(메가와트시)급이며, 올해 11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는 연평균 100회 이상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전력의 생산·공급량과 수요량이 아직까지 불균형한 가운데 BESS 확보로 전력계통 안정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력을 저장해 필요한 때 공급할 수 있는 ES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할을 한다. 태양광·풍력 등 날씨에 따라 편차가 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소·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ESS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110억달러에서 오는 2030년 2620억달러로 약 24배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한국의 ESS 시장은 정책 부재, 안전성, 경제성 등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신규 설치량 최대치를 기록한 국내 ESS는 2020년 보급 지원 제도 종료 이후 2022년, 4년 전 대비 1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누적 보급량은 4.1GW에 그쳐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2018년 전후로 설치량 증가와 함께 화재 사고가 늘어나 ESS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불거졌고, 당시 비용 측면에서도 ESS 설치보다 발전원의 출력제어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업계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충해 온 만큼, 전력 송·배전망 구축의 대안이자 분산에너지의 핵심 역할을 할 ESS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500MW 규모의 장주기 BESS를 설치해 2038년까지 총 21.5GW를 구축할 계획이다. 발주 이후 준공까지 최소 2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이를 실현하려면 올해부터 약 500MW 이상의 대규모 ESS 발주가 필요하다.

한국전력은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5개 변전소(소룡·논공·나주·선산·신영주)에 총 300MW 규모의 ESS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선산·소룡 변전소에 각각 56MW 규모의 계통 안정화용 ESS를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발주할 예정이며, 나주·논공 2027년 12월, 신영주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역시 앞서 착공에 돌입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92MWh 장주기 BESS 설치 사업에 이어 두 번째 BESS 사업 발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세부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양광 발전량 증가로 출력제어 문제가 심각한 호남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1년 말 약 42GW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전기본 확정 등에 따라 사업을 즉각 추진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다양한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러한 ESS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다시 기회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를 통해 올해 출시 예정인 ESS ‘JF2’ 셀을 선보였다. 3.4MWh의 배터리 시스템에 1.7MWh 배터리 시스템을 연결해 최대 5.1MWh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전 모델 대비 에너지 밀도는 약 21% 향상됐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LFP배터리의 성능을 대폭 높여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차세대 전력 제품에 발맞춘 스마트 안전장치에 대한 기술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급증하면서 전력망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2023년 하반기 이후 리튬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나트륨 배터리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기술 발전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최대 단점인 간헐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