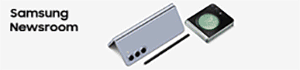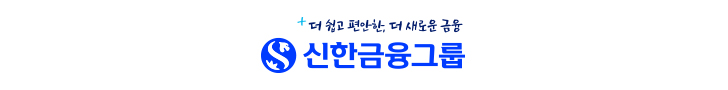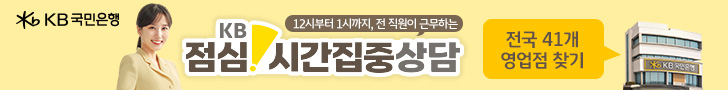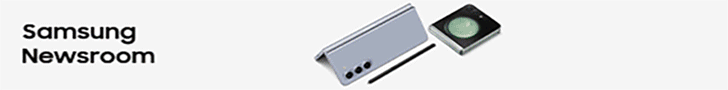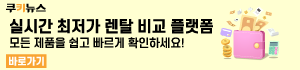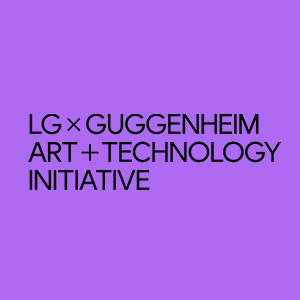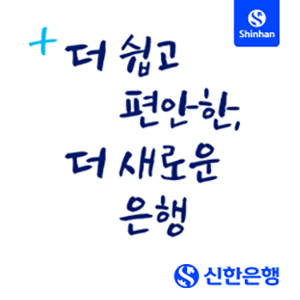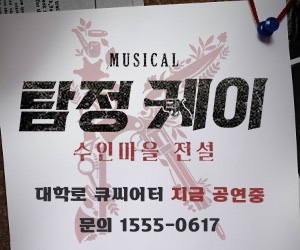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현재 한국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보며 문득 드는 생각이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여야 유력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양측 정당의 공약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탈원전은 아니지만 주로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원자력발전에 중점을 둔, 대부분 예측 가능한 공약이었다.
‘진보는 재생에너지, 보수는 원전’이라는 정당 색깔이 기저에 깔린 이번 공약만큼이나, 차기 정부의 첫 계획이 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여야 대립과 진통도 불 보듯 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출범할 차기 정부는 2026~2040년의 발전설비용량·발전 예상량을 정하는 제12차 전기본 수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전기본은 2년 단위로 향후 15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서 11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원전 비중을 놓고 약 1년가량 여야 대립 끝에 올 2월에서야 확정돼 곧장 다음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그사이 정작 중요한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응당 재생에너지·원전 등 발전설비가 앞으로 더 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설비나 생산전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곳곳으로 보낼 전력망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실제로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소가 지어졌음에도 가동하지 못하는 전력은 동해안 7GW, 서해안 3.2GW 등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송전선로 사업 31곳 중 무려 83%에 달하는 26곳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생산하는 전력이 ‘물’이라면 우리나라의 부족한 전력망은 ‘밑 빠진 독’인 셈이다.
전력망 사업 지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주민수용성 문제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이번 대선에서 발전원뿐만 아니라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공약은 내놓았으나, 구체적으로 주민수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천문학적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해 당장 사업에 착수할 것인지 등 세부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력 전문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조차 10년가량 애를 먹고 있는 주민수용 문제가 대통령 당선으로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재생에너지와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서로를 배척의 대상이 아닌 동반 성장 관계로 보고 있었다. 전력공급·수요 간 불균형이 출력제어로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전력망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어느 한쪽의 에너지원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념, 발전원 비중과 같은 구호나 숫자에 매몰된다면 우리는 또 실패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압박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겐 예전처럼 ‘숫자놀음’을 할 시간이 없다. 차기 정부에선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본질적인 문제를 찾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핀셋 처방’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