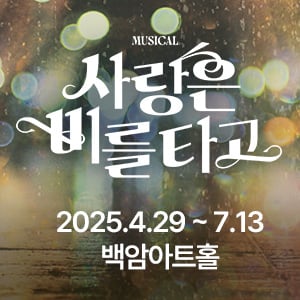의료 취약지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더 이상 지역의료 공백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메울 수 없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지역의료를 책임질 새로운 의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김혜경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연구소) 이사장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보의로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땜질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공보의 대신 보건지소 운영을 맡을 의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공중보건 체계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한 조직으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 전문가 약 170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보건의료기관은 3601곳이다. 이 중 보건소 261곳, 보건지소 1338곳, 건강생활지원센터 104곳, 보건진료소 1898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의사 외에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공보의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1318명이던 신규 공보의 수는 2021년 1035명, 2022년 1050명, 2023년 1114명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716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공보의 수도 2021년 3524명에서 2022년 3365명, 2023년 3172명, 2024년 2855명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공보의는 2000명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 갈등 여파로 인해 공보의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1학기 208명, 2학기 210명보다 각각 9.97배, 9.88배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학기 군 휴학은 602명, 2학기는 1147명으로 늘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의대 남학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호하면서 공보의 배출이 급감하고 지역의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공보의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3년의 공보의 근무 과정을 수련 체계에 편입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수련 트랙에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을 마련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차의료 관련 교육과 공보의 훈련을 시키고 보건지소에 배치해 근무하게 하는 것이 지역의료 공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공보의 대신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지역건강돌봄전문의(가칭)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주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선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이 결합된 훈련을 받은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인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 내 통합 건강돌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건강돌봄 전문 인력과 지역 건강 활동가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법 자체가 미비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돌봄센터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구성해 가정을 방문하면서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법에 건강돌봄 전담부서인 보건소의 역할 규정이 없고, 의료·예방·복지서비스 연계를 전담할 인력 구성이 전무한 상태”라며 “각 보건소에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해 이를 뒷받침한다면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연구소장(한림의대 보건과학대학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노년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돌봄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만들어진 지 50~60년이 됐다. 이젠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