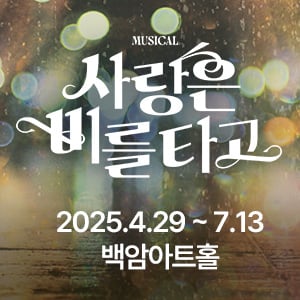“모기랑 다를 게 없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모(25)씨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를 도무지 익충으로 여길 수가 없다. 해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체감은 달랐다. 이씨는 “옷에 붙은 러브버그를 떼어내려다 흔적이 남을 때가 있다”며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진 영상을 언급했다. 그는 “인천 계양산 정상에 몰린 벌레 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커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의 말처럼 러브버그는 지난달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유독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 서북부 지역이 대발생의 시작점이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까지 퍼진 러브버그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생태계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러브버그는 수십 년간 대규모로 번식하며 생태계에 적응한 뒤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플로리다 등 미국 남동부 지역은 1960~1970년대 러브버그 대규모 발생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후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플로리다에서는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연구하던 변이종이 탈출했다”는 뜬소문까지 떠돌았지만, 플로리다대학교는 “멕시코에 자생하는 곤충이 퍼진 것”이라며 연구소 낭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미국 남동부로 퍼진 러브버그의 학명은 플레시아 니악티카(Plecia nearctica)다. 멕시코만 연안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국내에서 발견된 플레시아 롱기포셉스(Plecia longiforceps)와는 다른 종이다.
이 곤충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매개 질병도 없으며 꽃의 꿀을 먹고 산다. 하지만 시체가 차량에 달라붙으면 일부 산성 성분으로 페인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현재는 러브버그 개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감소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다. 연간 강우량과 천적 등의 환경적 요인이 개체수 변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생 곰팡이(Beauveria bassiana)가 러브버그 개체 수 조절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마디로 대규모 방제나 퇴치가 진행된 사례는 없고, 생태계가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내 연구자들 역시 방역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방역제를 이용하면 러브버그의 천적 또한 죽을 수 있다”며 “서울 은평구도 대벌레를 잡기 위해 방역했다가 러브버그가 증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러브버그의 정확한 유입 경로를 알 수는 없고, 벌레 한 종만 죽일 수 있는 방역제는 없다”며 방역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러브버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 생태계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시민들의 일상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