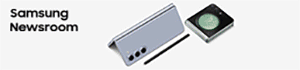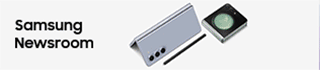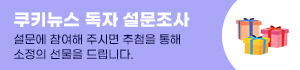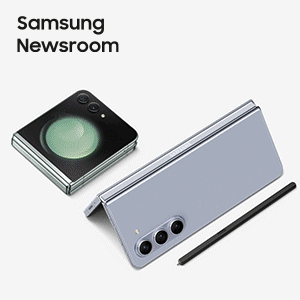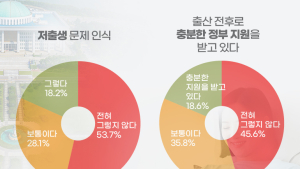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52) 과장은 2012년 11월 중국 내 정보원을 통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원본을 입수했다. 1년 뒤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입수한 출·입경 기록과 마찬가지로 유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연속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내용(入-入)이었다. 당시는 유씨가 체포되기 두 달 전으로 국정원이 유씨에 대한 내사를 한창 진행할 때다. 해당 문건은 발급 날짜나 발급처 관인조차 없는 첩보 수준의 자료에 불과했다. 1심 재판 때 증거로도 제출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씨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유씨의 행적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해지자 국정원은 ‘작업’을 시작했다. 이모(55) 대공수사처장과 권 과장은 그 다음달 18일과 26일 국정원 사무실에서 주중 선양총영사관 이인철(49) 영사에게 두 차례 전문을 보내 “첨부된 확인서 견본을 참조해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영사는 중국 당국에 전혀 확인하지 않고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선양영사관 관인까지 찍어 국정원 본부로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확인서를 법정에 내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 때부터 본격적인 증거 위조에 나섰다. 대공수사팀은 내부 회의를 거쳐 중국 내 협조자를 동원키로 결정했다. 김모(48) 과장은 같은 해 10월 협조자 A씨로부터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 검찰에 전달했다. 그런데 공판담당 검사가 이 출·입경 기록이 실제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외교부를 통해 정식 공문을 보내면서 문제가 더욱 꼬였다.
국정원은 외부 협조자로부터 구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공문이 허룽시 공안국 책임자에게 도달하기 전 중간에서 이를 가로챘다. 동시에 A씨에게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발급 사실확인서’를 위조하도록 했다. 이 처장 등은 그해 11월 27일 대공수사팀 사무실에서 마치 허룽시 공안국이 팩스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해 가짜 발급 확인서를 이 영사에게 발송했다. 결국 이 공문은 중국 당국의 공식 회신인 것처럼 포장돼 선양총영사관과 외교부를 거쳐 검찰에 인계됐다.
국정원은 변호인이 이후 재판에서 중국 공문들에 대한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또 반박하기 위해 협조자 김모(62)씨를 통해 싼허변방검사참 공문마저 조작했다.
결국 2012년 11월 정보활동으로 입수한 최초 자료가 증거로 쓰이지 못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협조자 등을 통한 불법 행위에 나선 셈이다. 검찰 한 간부는 “정보활동과 수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양쪽 다 오염되게 된다는 극명한 사례”라며 “정보기관이 적국도 아닌 자국 정부와 법원을 속이려다 들통난 꼴”이라고 말했다. 공안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공안 관련 수사의 패러다임을 재점검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국정원이 뛰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38일 간의 수사 끝에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 3건 중 2건이 위조됐음을 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공문을 입수했다는 협조자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중국 측의 답변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조자 김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게 했다가 곤경에 빠졌던 국정원은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