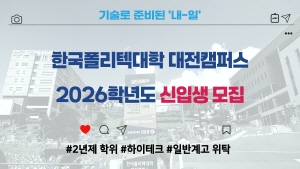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외숙모는 어버이날이 되면, 일찍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대신 손위 시누이였던 우리 엄마를 찾아왔다. 진짠지 아닌지 지금은 헷갈리지만, 대학시절 퀸이었단 소문만큼 예쁘고 싹싹했던 외숙모를 난 참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외숙모는 나를 위해 손으로 직접 뜬 도시락 가방이나 레이스 붙인 치마 등을 선물하셨다.
내 손가락에 우유를 묻혀 빨려 키운 치와와 강아지 두 마리, 예쁜이와 고운이를 받아온 것도 외숙모 집에서였고 난생 처음 엄마와 떨어져 외박을 해볼까 하고 놀러 갔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 밤에 울고 불며 택시를 타고 돌아온 곳도 그 집이었다. 그리고 그 시절 외숙모를 아줌마라고 부르던 내게 '아줌마는 아무에게나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이니 내게는 꼭 외숙모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신 분도 그 외숙모였다.
그러나 어느 해부턴가 나는 외숙모와 점점 멀어졌다. 외숙모가, 그림같이 예뻤던 열다섯 살짜리 딸을 잃은 뒤부터였다. 내가 정말 귀여워하던 사촌 동생이 죽었으니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던 외숙모에게 나라도 조금이나마 딸 노릇을 했다면 좋았으련만 그 뒤, 나와 외숙모는 어쩐지 만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외숙모가 내게 한 말은 ‘아직도 딸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다’는 말씀이셨는데 나는 그때야 결혼하고도 남편에게 이름을 불러대던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 천사같이 예뻤던 내 사촌 여동생과 똑같은 내 남편 이름을 내가 외숙모 앞에서 얼마나 무심하게 불러댔을지 후회가 되었다.

외숙모는 아파도 아프단 소리도 없이 슬퍼도 슬프단 소리도 없이, 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밝고 환하고 근사하시다. 그처럼 외숙모의 글 속에도 아프다거나 슬프다는 게 없다. 그걸 보면 외숙모는 마치 ‘때려도 입 꽉 깨물고 아무 소리도 안 지르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진다. 수필집이란 게 어차피 다 자신의 얘기인데도 자신의 속이 전혀 없는 듯싶은 책을 읽다 보면 배고픈 아이들이 밥 달라고 우는 것을 볼 때보다 때로 아무 표정도 없이 있을 때 더욱 처연하듯, 나만 아는 아픔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리고 외숙모 얼굴의 웃음까지 마치 평생 외숙모가 쓰고 사는 데드 마스크처럼 느껴져 나는 외숙모가 낯설고 한편 외숙모를 진심으로 다시 헤아려 본다.
아무튼 외숙모의 수필집을 읽으며 외숙모와 나의 연분홍 시간을 돌이키고 우리의 봄날이 가니, 그러고 보니 그 어린 사촌 여동생처럼 일찍 예쁜 조카를 떠나보낸 우리 올케의 생일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을 나의 올케는 우연히도 또 우리 애들의 셋째 외숙모다.
이 밤은 세상의 모든 셋째 외숙모들이 특히 평안하길... 나의 봄은 유월이 시작되며 갔지만 어쩌면 어느 날 이후, 영원히 봄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느 때고 다시 한 번 봄이 시작되길... 그 아프고 시린 사람들에게 가장 곱고 예쁜 마음을 주고 싶은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