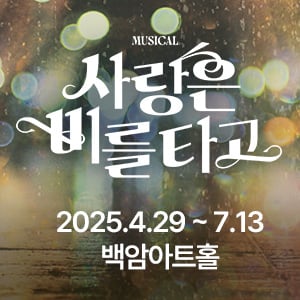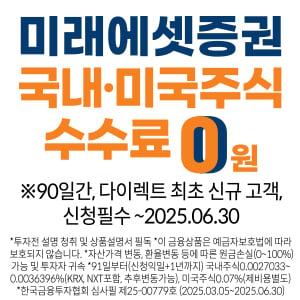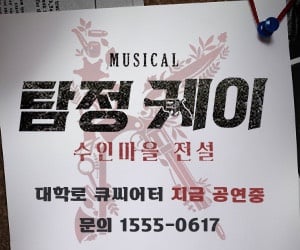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의 급여가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효능 논란이 일던 콜린 제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정당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서, 처방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종근당 등 26개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제약사들은 지난 5년간 진행한 소송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콜린 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눠 콜린 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심이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 그룹 등이 제기한 소송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뇌졸중 등 뇌병변이 있는 환자들의 뇌기능을 보호하는 용도로 처방되는 약이다. 사회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도 처방이 확대되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지난 2023년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처방액은 56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치매가 없는 사람에게는 인지기능 개선이나 치매 예방 효과가 없다는 효능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한국 정부가 약가 정책에 참고하는 8개 국가(A8)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당 성분을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 역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지난 2019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콜린 제제의 급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며 콜린 제제가 효능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효능이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제약사들은 그동안 콜린 제제 처방액 전체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제약사들은 부채 비용을 크게 늘리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해 522억원, 대웅제약은 935억원을 건보공단에 납부할 환불부채로 인식했다. 1년 전에 비해 각각 273억원, 255억원 늘었다. 종근당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콜린 제제의 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실패로 결론날 경우 공단에 내야 할 돈 때문에 최근 환불부채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게 콜린 제제를 처방하면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급여 축소 방침에 따라 콜린 제제 처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환자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콜린 제제의 처방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치매 예방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유용성이 있는 치료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콜린 제제 시장이 위축되면 유사한 적응증을 가진 니세르골린, 은행엽엑스 제제가 대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교수는 “현재 진료 현장에서는 니세르골린, 은행엽엑스 제제의 처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기전은 모두 각각 다르지만 콜린 제제의 임상적 의의를 고려하면 비슷한 용도로 진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엽제제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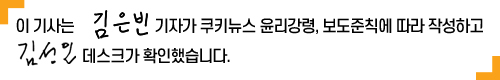






![“치매 예방 효과 없는데”…콜린 의약품, 지난해 처방액 5000억원 넘어 [2024 국감]](/data/kuk/image/2024/10/14/kuk202410140001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