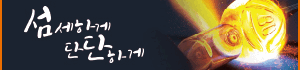몇 년 전 인레이치료를 받은 곳은 내 산책길 끝에 새로 문을 치과였다. ‘아픈 이를 치료하기보단, 아픈 이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과’라는 입간판을 세운 곳이었다. 나는 이도 마음도 안 아팠지만 그 문장에 끌려 거기에서 치아 정기검진을 받았다. 검진 뒤에 젊은 의사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내 나이를 물었다. 평소 치아에 전혀 불편이 없었는데도 내게 당장 어디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하고 돈도 많이 들 거라고 했다. 입 간판대로라면, 이가 아니라 아플 내 마음을 걱정하고 있을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에 나는 점점 이가 아파지는 기분이었다. 진짜 어딘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싶어 개점 할인도 있다는 말에 생각할 새도 없이 받은 치료비, 이백만 원을 할부로 결재할 땐 마음까지 아팠다.
공연히 건드려선지, 딱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 치료를 마친 뒤부터 나는 전만 못해진 이 때문에 치과를 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소개받은 다른 치과에서 동년배의 의사로부터 새 진단을 받았다. ‘그러려니 하고 대충 달래며 사세요. 살아있으니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의사의 손길은 뭔가 좀 투박했으나 그의 말은 거친 손으로 가려운 등을 훅 긁어주는 듯했다. ‘내 이는 아직도 살아있군, 차가우면 시리고 아니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군.’ 나는 이도 마음도 개운해져 치과를 나왔다. 투박하다 싶었던 의사가 새삼 쿨하게 느껴지며, 분명 그 전의 치과는 과잉진료였던 것이란 의심이 들었다. 별 근거는 없었다.
입안 깊숙이 동굴처럼 뚫린 자리를 혀로 쓸어주는데, 느낌 탓인지 등줄기에 뭔가 박힌 듯 이물감이 든다. 부러진 어금니보다 그걸 잘못 삼킨 것이 더 찜찜해 치과에 전화를 했다. 여전히 쿨한 의사는, 생선 가시도 아니고 이 조각이 박힌 것 같다는 나에게 밥이나 한입 크게 꿀떡 삼켜보라며 치아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은근히 ‘이 없으면 잇몸으로 대충 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나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의사에게 좀 실망했다. 연례행사처럼 먹다 말다하는 칼슘 약을 오랜만에 꺼내먹으며 마음까지 치료한다던 몇 년 전의 치과를 떠올렸다. 어쩜 내 치아는 이미 그때부터 뭘 잘못 씹거나 아프지 않아도 이유 없이 부러질 만큼 나이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그 젊은 의사는 그저 좀 앞서서 친절했던 사람같이 여겨졌다. 그리고 내가 진정 의사에게 바란 것은 치료였던가, 그냥 무조건 안심만 시켜주길 원한 것이었던가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가끔 의사가 힘든 기본업무 외에도 어려운 요구를 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치료 외에 서비스직처럼 위안까지 주길 바랄 때나, 때로는 신의 영역인 기적까지 실현해주기를 기대받을 때, 또 따지고 보면 의사란 직업도 그들에게는 생업일 뿐인데 모두가 몸을 사리는 사태에도 과도한 사명감을 부과받고 독립운동가처럼 나라를 구해야 할 때…. 그걸 생각하면 의사는 의사대로 참 딱해 그렇게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존경심이 든다.
한자로 의사(醫師)는 판검사(判檢事)나 변호사(辯護士), 혹은 기술사(技術士) 와는 다른 스승 사(師)를 쓴다. 아마도 이 글자를 붙이는 직업은 의사와 교사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데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환자의 절실함이 의사와 그 업무에 존중을 만들었을 것이다. 공공 의대 설립안을 비롯한 정부와 의협의 쟁점 차이로 파업을 단행하고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료진들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실시를 청원했다. 사태의 원인과 시비, 찬반과 관계없이 나는 오직 의사가 우리가 부르는 호칭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의사는 그럴 수 있어도, 결코 스스로 파업할 수 없는 환자들, 우리는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른다. 엄마는 엄마라고 불려서, 가장은 가장이라고 불려서, 그 무게를 견딘다. 우리들의 선생님은 그 무게를 견디고 그 무게를 가치와 긍지로 여기는 사람이면 좋겠다.



































![[기획특집] 참 삶을 가꾸어 더불어 성장하는 참 좋은 교육](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1/10/kuk20241110000160.300x20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