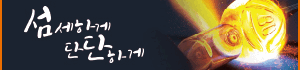시력교정 수술로 개안을 꿈꾸었던 아들은 좀 실망을 했다. 나는 혹시라도 더 잘못되면 어쩌나하는 우려 때문에 아들의 수술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막상 아들이 수술도 못한다니 속이 상했다. 내 눈은 망막에 구멍이 나 레이저로 때우기까지 했지만 그건 어찌 됐든, 아들을 그렇게 낳은 것만 안타까웠다.
검사를 받느라 확대해 놓은 동공이 자리를 잡는 동안, 우리는 어른거려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다. 드디어 우리 모자가 수술로 시력 2.0의 광명을 찾았다는 거짓복음이었다. 거짓이라도 한 번 쯤, 꿈이라도 한 번 쯤, 안경이나 렌즈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던 순간이었다.
어렸을 때 내 별명은 왕눈이였다. 눈도 컸지만 겁도 많아 툭하면 눈을 부릅뜨고 놀라서 오빠들은 내 눈 밑에 손바닥을 대곤 눈알 떨어지니 받으라고 놀려댔다. 그 별명은 초등학교 땐 이미 실눈으로 바뀌었다. 눈은 점점 나빠지고 안경만으론 시력교정이 안 되어 계속 눈을 찡그리고 살아서였다. 그러다 처음 콘택트렌즈를 끼게 되었을 땐, 난 세상이 그전까지 내가 보았던 세상과 많이 다른 것에 충격을 받았다. 늘 물속에 있는 듯 조금씩 어른거렸던 세상은 불쑥 빛이 났고, 빗살무늬토기처럼 바라보던 무엇들은 그저 흠집만 가득해 볼품없던 것임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뒤 나는 안경으로 본 세상과 콘택트렌즈로 본 나의 세상이 이렇게 달랐듯, 내가 렌즈로 굴절시켜 보는 세상과 실제의 세상은 같은지 어떤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 유난히 눈이 크고 예뻤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안경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내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아들이 헉헉거리며 집에 왔다. 학교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멀리 보면 평양까지 보이고 가까이 보면 갈비뼈까지 보이는 안경을 판다’는 것이었다. 망원경도 아니고 현미경도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데 돈을 내고 사야만 진짜인지도 볼 수 있다니 분명 노점상이 어린애들을 속이려는 것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아들 손을 붙잡고 학교 앞까지 나간 것은 그때도 내 시력을 닮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벌써 안경장수는 사라지고 아들은 실망을 했었다. 나도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안과를 나와 집에 오는 동안 나는 아들이 그새 좀 작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양말 구멍을 때우면 발꿈치가 조여드는 것처럼, 내 눈 구멍도 어딘가를 때웠다더니 아들까지 줄어든 건가. 징그러울 정도로 커버렸다고 생각했던 삼십 대의 아들이 이상하게도 작게 느껴졌다. 뭔가 아들이 크게 밑진 듯,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조차 사라진 듯, 딱하고 짠했다.
젊은 날엔 망아지처럼 뛰놀다, 지금은 도인처럼 나이 들고 있는 친정 오빠는 늘 내게 말한다. ‘아무리 같이 살아도 성년이 된 자식에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걱정도 기대도 버리고 그저 앞집 청년, 옆집 아가씨 정도로만 보고 살라’고...
나도 이제는 내 아들딸이 조용한 이웃처럼 별 일 없기만 바라며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의 이웃을 스토킹한다. 앞집 청년의 작은 불운에도 아파하고 옆집 아가씨의 소소한 행운에도 기뻐하면서... 어쩌란 말인가. 세월이 화살같이 흐른 뒤, 난 지금 이 시간을 또 얼마나 그리워할지 이미 내가 아는 걸.



































![[기회특집] 참 삶을 가꾸어 더불어 성장하는 참 좋은 교육](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1/10/kuk20241110000160.300x20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