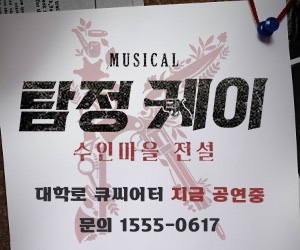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인증을 받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성 인증 표시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인증제는 지난 8월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 국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배터리 제작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원표와 함께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열 충격 시험, 연소 시험, 과전류 시험 등 12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국토부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 인증을 취득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발화 원인 규명 전까지는 배터리 제품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한 번 받은 인증서는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는 거짓 정보로 인증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결함이 밝혀진 경우에 이뤄진다”며 “동일 부품에서 비슷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 결함 조사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차량이 전소돼 발화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소실된다는 점이다. 또 배터리 발화 지점이 파악되더라도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지난 14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EQC400 4MATIC 전기차 화재 차량에 국내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8월 140여대 차량을 파손시킨 벤츠 EQE 350 전기차 화재 당시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파라시스 배터리 팩을 감정했으나 배터리관리장치(BMS) 연소로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같은 달 국내 제조사 SK온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한 기아 EV6 화재는 장비 부족을 이유로 국과수에서 감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해당 화재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발화된 지점의 배터리 팩 원형이 남아있었음에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해당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섣부른 단계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동차 제조사는 현대차·기아뿐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는 이륜차 배터리 부문에만 참여한다”고 말했다. 삼성SDI와 SK온은 배터리 인증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불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는 “정부는 당장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배터리도 차량에 탑재해 출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현대차·기아가 계속 참여한다면 현대차그룹만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 예고했다. 하위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