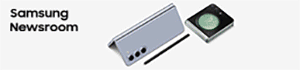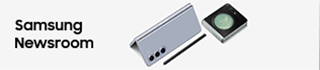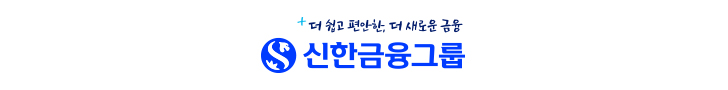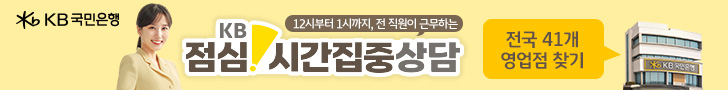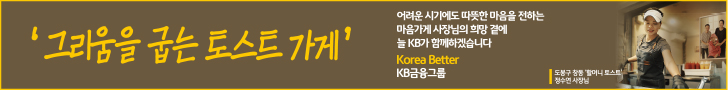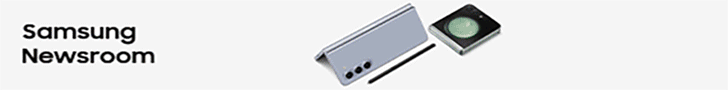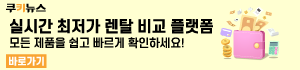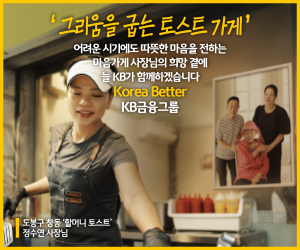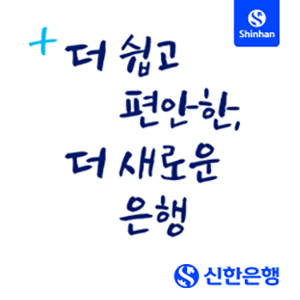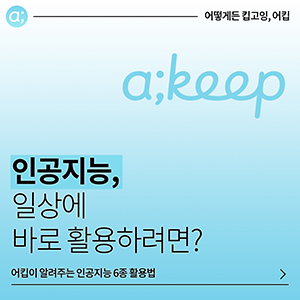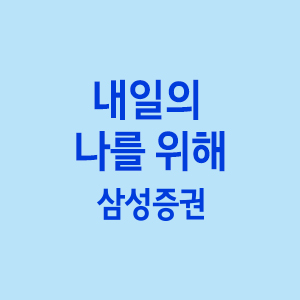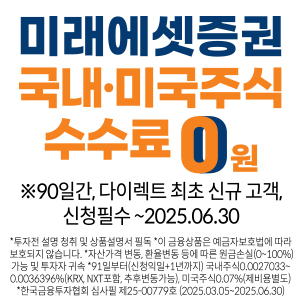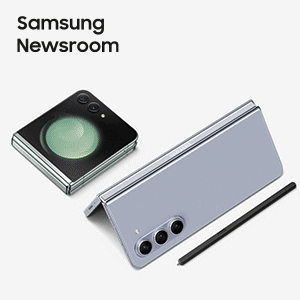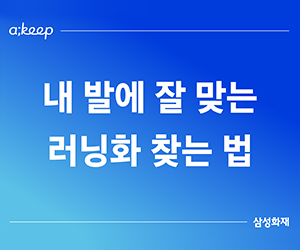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청기백기 게임이 일어났다. 정부와 서울시는 2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지했다. 이후 단 35일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단 35일, 정책을 뒤집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시장은 요동친 후였다. 이미 송파구 일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랐다. 지난해 8월 60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단 7개월 만에 10억원이 상승했다. 잠실리센츠(전용면적 84㎡)도 수일 만에 3억원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토허구역 해지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결국 시와 정부는 한 달 만에 집값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 재지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남3구 및 용산구는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토허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정부와 서울시의 뒤늦은 대응에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이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총 116건의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이 중 34.5%에 해당하는 40건이 신고가로 계약됐다. 특히 토허구역 재지정 직전 5일간 강남에선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미 거래할 사람들은 기간 내 완료했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불안한 대응으로 수요 억제가 규제 완화 이후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남겼다는 점이다. 이른바 규제와 가격에 대한 ‘학습 효과’를 시장에 남긴 것이다. 토허구역 재지정은 한시적 대책으로 정부는 6개월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언제까지고 거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달 새 수 억원의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의 강남3구 쏠림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두고 “결국은 강남3구로 가야 한다는 걸 깨우친 시간”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이 안타까운 여운을 남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돼야 한다. 시장 안정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달성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아울러 토허구역은 결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답이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단기적인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3구에 몰린 수요 분산이다. 강남3구만 오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