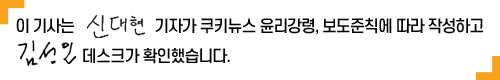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중국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21년 24.4%에서 2022년 11.9%로 2배 넘게 급감했다. 2008년 21.7%에서 등락을 반복한 끝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원료의약품 수입 규모는 증가했다. 2021년 20억9000만달러(한화 약 2조7431억원)에서 2022년 24억3000만달러(3조1888억원)로 16.3% 늘었다.
자급도가 낮아졌단 것은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원료의약품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중국, 인도, 일본에서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60%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2022년 중국에서 9억1000만달러(1조1943억원) 규모를 수입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인도가 3억달러(3937억원)로 2위, 3위는 2억4000만달러(3150억원)가 수입된 일본이 차지했다.
이런 동향은 지난 10년간 7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자급도와 상반된다. 2022년 완제의약품 생산액은 25조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반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2022년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3조3791억원으로, 303개사가 생산하고 있다. 이 중 81.5%를 차지하는 247개사는 100억원 미만의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가격 경쟁이 심한 원료의약품의 특성에 기반한다. 국내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의 원료의약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뜻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가격 경쟁이 심해 국내외 기업들은 대개 값이 싼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마저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인도 제네릭 의약품의 주원료 70%가 중국에서 수입된다. 인도 의약품수출진흥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인도가 중국에서 수입한 주원료 규모만 31억8000만달러(4조1731억원)에 이른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의약품을 선정하고, 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외 정책 동향을 참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원료의약품 의존 고리를 끊기 위해 인도는 지난 2020년부터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에게 자국 제조 제품의 매출 증가분과 한계 투자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최대 6년간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벌크 의약품(대용량 형태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3개의 PLI 제도를 추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인도 신용평가기관(IRRA)은 향후 4~5년 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25~3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직과 법제도 정비 △자국 내 지속 생산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해외 동맹국 협력 확대 등 원료의약품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약가나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면 국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원료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 보건안보 측면에서 예산 투입 대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