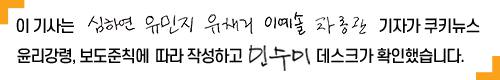사회 위계는 건물에도 있다. 돈이 이를 구분 짓는다. 지난여름, 반지하에 산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건물의 위계가 생사를 갈랐다.
정부는 반지하를 비정상거처로 규정하고, 그들을 땅 위로 올리는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상이 아닌 그곳엔 여전히 사람이 산다. 나가지 못하는 사람과 빈자리를 채운 사람. 예고된 재해 앞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세 편의 기사에 담았다. [편집자주]

지난해 여름 박수환(55·가명)씨의 반지하 집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 정확히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폭우가 내린 날이었다. 박씨는 이곳에서 십년 넘게 살았다. 현관에 물이 고인 적은 있어도 집 전체가 잠긴 것은 처음이었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였다. 처참한 수해 현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베란다 유리는 전부 깨졌고, 세탁기는 쓰러져 있었다. 방 안엔 책장과 집기가 흙을 덮어쓴 채 얽혀 있었다. 흙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화장실에 고여 있었다.
십오년 전 박씨는 신림동에 방 세 개짜리 반지하 집을 마련했다. 지인을 통해 어렵게 구한 집이었다. 낡은 반지하였지만, 내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6000만원에 집을 매입한 박씨는 이사 후 보수공사에만 3000만원을 썼다. 그러나 수해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안전한 집을 구하고 싶었던 그의 바람은 욕심이 됐다.

침수된 집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또 공사를 했다. 도배, 장판은 물론 누전된 전선 수리, 보일러 설치, 부식된 석고 벽 수리까지 해야 했다. 총 4900만원이 들었다. 오래된 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은 절반만 나왔다. 남은 2400만원은 고스란히 빚이 됐다.
공사를 하는 동안 박씨 가족은 급하게 3개월짜리 월세를 구했다. 세 달 간의 공사가 끝나고서야 세 식구는 반지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일기예보에선 올해도 폭우가 내린다고 한다. 침수를 조심하라는 뉴스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박씨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지만, 이내 포기해야 했다. “집을 팔기는 어렵다고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침수된 적 있는 반지하를 매입할 사람은 없다고요.”
박씨는 이제 빗소리만 들으면 긴장한다. “이사를 못가면, 앞으로 침수될 때마다 몇천만원씩 빚을 지면서 공사해야 돼요. 올해는 또 얼마가 들지 모르겠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반지하가 아닌 곳으로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11일부터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없애기 위해서다.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씨가 사는 건물도 매입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반지하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사는 빌라는 총 아홉 세대. 매입을 위해서는 박씨를 포함한 다섯 가구가 서울시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반지하가 우리집 한 가구뿐이에요. 위층은 침수 피해 입은 적도, 걱정도 없으니, SH에 집을 팔 리가 없죠. 저 혼자 세대 절반의 매매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애초 집을 팔 생각이 없던 지상층 거주자들을 설득할 마땅한 이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SH 임대주택 매입가는 감정평가 기준을 따른다. 실거래가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가능성이 크다.

SH는 반지하 세대주들 사정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실제로 다세대 가구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세대수 절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항의를 많이 한다.”며 “그렇지만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떠나야 한다. “백날 정책 내면 뭐 해.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데. 나 같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집을 사 가지 않는 이상 이사 못 가요.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집을 팔아요.”
심하연, 유채리, 유민지, 차종관, 이예솔 수습기자 sim@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